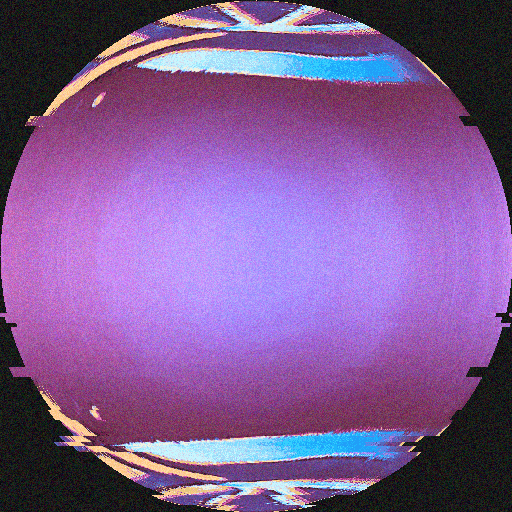June 26, 2025 at IG Fortuna Leipzig.
With our team and all the participants of this exhibition:
Hyelim Jeon, Yunju Shin, Hyeyun Lee, Chaebin Han, Juyoun Oh, Hani Gimna
Recording: Yunju Shin
Rewritten n in text form by: Hyelim Jeon
혜윤> 확실히 토요일이다.
Hyeyun: It’s definitely Saturday.
혜림> 지금 녹음 되고 있는 거지? 하면서 끊어갑시다
Hyelim: Is it recording now? Let’s break it up if it gets long
윤주> 이 얘(녹음기)를 들고 말을 해 다들. 다들 들고 말해. 이거 들어. 아니 여기 가운데 이렇게 붙여. 어.
Yunju: Everyone, speak into this (recorder). Really, take turns holding it. Hold it close to yourself like this.
혜림> 일단 그러면 처음 이 오픈콜 지원 공문을 다 어떻게 접하셨어요. 메일로 받으셨나 아니면 인스타로 보신건가
Hyelim: So, how did you all come across the open call? Was it through email or Instagram?
하늬> 저는 학교 메일로 봤었어요.
Hani: I saw it via the university email.
채빈> 저도 학교 선생님들이 지원해 보라고 연락이 따로 와서. 근데 학교 메일 오기 전에 하여튼 어디서 봐서 알고 있었는데, 학교 메일 교수님이 메일을 보내서 지원을 해봐라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Chaebin: For me too—my professors actually contacted me and said I should give it a try. But I think I had already come across it somewhere before that.
혜림> 그럼 그 글(모집 공고)을 먼저 읽어보셨을 거잖아요. 봤을 때 뭔가 어떤 쪽에서 좀 지원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Hyelim: So you must’ve read the text explaining the project’s theme. Was there anything in particular that made you want to apply?
채빈> 저는 일단은 한국분들이 하신다는 거에서 조금 음 해봐야지 이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어쨌든 간에 제 모국어이고 다 한국인 여성들이 함께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한 번쯤 해볼까 이러고, 그리고 또 주제도 어쨌든 미디어 인지 체계라는 주제가 저한테는 조금 사실 막 그 전에는 인지 체계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미디어로 뭘 인지한다까지는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미디어를 다루는 사람이니까. 일단은 미디어 뭐 하는 거면 일단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해보게 된 것 같아요.
Chaebin: Honestly, I think what drew me in was that it was organized by Korean people. Since it's my native language and the idea of working together with other Korean women felt familiar, I thought, “Maybe I could give it a try”
Also, the topic—“media-based cognitive systems”—I hadn’t really thought deeply about it before. I mean, I’ve worked with media, but I hadn’t considered how media shapes cognition. But since I work with media anyway, I figured, why not try?
Also, the topic—“media-based cognitive systems”—I hadn’t really thought deeply about it before. I mean, I’ve worked with media, but I hadn’t considered how media shapes cognition. But since I work with media anyway, I figured, why not try?
주윤> 저는 우선적으로 약간 프로젝트명이 제일 흥미롭게 다가왔었어요. 왜냐하면 'media narrtive explorers'. 재밌잖아요. 약간 한 번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과 결이 맞는다는 느낌도 들었고 또 제가 오픈콜을 그래도 해보면 비슷한 작업 아니면 비슷한 테마에 관해서 작업하신 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오픈 콜에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Juyoun: For me, the first thing that caught my attention was the title of the project: Media Narrative Explorers. It was intriguing. It immediately felt aligned with the direction of my own work, and I thought if I applied through this open call, I might get to meet others who are working on similar themes. That was really appealing to me.
하늬> 저도 그 타이틀이 좀 직관적이면서도 흥미를 끌기가 충분해서 일단 눈길이 갔었던 것 같고요. 저도 관심사 자체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을 어떤 형식에 넣느냐보다는 어떤 미디엄이나 형식이 어떻게 내용을 생산하는지 혹은 서로가 어떻게 조건 짓는지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진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을까? 이렇게... 또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이다라는 되게 구체적인 지점들도 그러면 뭔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룬트강 같은 것도 가면은 뭐 이렇게 막 국적별로 막 작업이 좀 보이는 그런 어떤 특색이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만약에 이제 여러 학교에서 작업 열심히 하시는 한국분들끼리 전시를 했을 때 어떤 또 재미있는 색깔이 나올까 이런 것도 좀 궁금했었던 거 같아요.
Hani: I also found the title intuitive yet engaging—it really caught my eye. My main interest isn’t so much about the specific content or how it's expressed, but rather how different mediums and forms generate content or condition its form. So I was curious—would there be others with similar thoughts?
And the fact that it was specifically for Korean students studying in Germany felt like a concrete point of connection. At events like Rundgangs, you often see certain national traits reflected in people’s works. I thought it would be interesting to see what kind of unique qualities might emerge if Korean students from different schools exhibited together.
And the fact that it was specifically for Korean students studying in Germany felt like a concrete point of connection. At events like Rundgangs, you often see certain national traits reflected in people’s works. I thought it would be interesting to see what kind of unique qualities might emerge if Korean students from different schools exhibited together.
혜림> 말씀 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프로젝트 기획할 때 이 여름 전시를 기획하면서 이걸 왜 한국인으로 특정을 했냐면, 일단은 저희가 탐구 카테고리를 어쨌든 한국 독일 이렇게만 좁혔단 말이에요. 전 세계로 확대시키지 않고. 그랬을 때 뭔가 이제 한국에서 넘어온 독일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 작업을 보면은 이게 너무 특색이 어쨌든 드러나고 의도 했든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든, 심지어는 또 막 독일에 왔으니까 독일스러운 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작업 해도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그런 '저 사람 작업은 한국인 작업 같다'... 그리고 뭐 우리가 콜로키움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도 설명을 들어보면 이 사고 흐름이나 작업으로 발전시키는 과정 자체가 우리는 너무 닮아 있으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를 뭔가 되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문화권에서 영향을 받은게 크다, 그거를 먼저 이렇게 두 카테고리로 나눠서 탐구를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시작한 게 있었죠. 이제 처음엔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이게 또 첫 번째 약간 난관이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먼저 하고 있으면 쉬운데 혜윤이 같은 경우는 일단 미디어에서부터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좀 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미디어라고 말할 때는 보통 디지털 미디어라고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다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Hyelim: As you mentioned, when we were first planning this exhibition, one of the reasons we decided to focus specifically on Korean participants was that we wanted to narrow the exploration category to just Korea and Germany—rather than expanding it globally.
When we look at works made by Koreans who moved to Germany, there’s always something distinct that stands out—whether it’s intentional or not. Sometimes it’s even like, “Well, I’m in Germany now, so I should make something that feels Germany,” but even then, there’s this unavoidable Korean-ness to the work.
We’ve had a lot of colloquiums, and when you listen to how korean explain their process—their thought patterns, and how their ideas develop into artworks—it’s striking how similar we are.
So I started wondering where that came from. And I realized that cultural context probably plays a big role. That’s why we decided to divide it into two cultural spheres and explore it from there.
That was the initial starting point. But right away, the first challenge was that not everyone immediately resonated with this idea. For example, with Hyeyun, there was already some tension around the idea of "media." So I’m curious—how does everyone understand or interpret “media”?
Because in general use, when people say “media,” it’s often automatically assumed to mean “digital media.” I wonder how each of you thinks about that.
When we look at works made by Koreans who moved to Germany, there’s always something distinct that stands out—whether it’s intentional or not. Sometimes it’s even like, “Well, I’m in Germany now, so I should make something that feels Germany,” but even then, there’s this unavoidable Korean-ness to the work.
We’ve had a lot of colloquiums, and when you listen to how korean explain their process—their thought patterns, and how their ideas develop into artworks—it’s striking how similar we are.
So I started wondering where that came from. And I realized that cultural context probably plays a big role. That’s why we decided to divide it into two cultural spheres and explore it from there.
That was the initial starting point. But right away, the first challenge was that not everyone immediately resonated with this idea. For example, with Hyeyun, there was already some tension around the idea of "media." So I’m curious—how does everyone understand or interpret “media”?
Because in general use, when people say “media,” it’s often automatically assumed to mean “digital media.” I wonder how each of you thinks about that.
혜윤> 미디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긴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언니가 프로젝트를 좀 제안을 해줬을 때 그러면 언니의 그 프로젝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언니한테 미디어는 뭐야? 이렇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미디어가 뭐야? 그래서 다들 어떻게 매체, 미디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매체라는 게 매개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도 미디어고. 그리고 어제 채빈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광등 신호등 같은 것도 미디어가 될 수 있고 뭐 책도 미디어가 될 수 있고. 근데 그중에 저는 좀 사람이 제일 흥미롭다고 생각하구요.
Hyeyun: I was genuinely curious how you all understand “media.”
When you first suggested the project to me, I actually asked you, “What does media mean to you?”—because I needed to understand your concept.
For me, “media” means a mediator. So even a person can be a medium.
And like Chaebin said yesterday, things like fluorescent lights or traffic lights can be media too. Books are media. But for me, people are the most fascinating kind of media.
When you first suggested the project to me, I actually asked you, “What does media mean to you?”—because I needed to understand your concept.
For me, “media” means a mediator. So even a person can be a medium.
And like Chaebin said yesterday, things like fluorescent lights or traffic lights can be media too. Books are media. But for me, people are the most fascinating kind of media.
채빈> 사람이라는 미디어... 저도 미디어 자체는 사실 중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걸 약간 투영시킬 수 있는 거면은 충분히 많은 것들로 해석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 이게 아니라 그 미디어 아트 자체만을 논하려면 사실은 약간 그 정의를 찾아보니까 디지털을 이용한 작업들이 들어가야 미디어 아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통은 그렇게 정의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범위가 넓어서… 약간 우리 항상 다 얘기한 거죠. 신문도 미디어고 작업도 미디어야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다 보니까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파인 아트와 미디어 아트의 약간 구분점이 무엇이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저는 좀 약간 아 그럼 약간 디지털을 사용한다는 이러한 약간 좀 경계점은 좀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Chaebin: Yeah, the idea of a person as media…
I also think of media as “something in the middle”—something that can reflect or project something else.
So to me, “media” can be interpreted in many ways.
But when it comes to “media art,” I looked up the definition, and apparently, it usually refers to art that involves digital technologies. That seems to be the common understanding.
So when we talk about media art, it gets a bit too broad.
Like we’ve said many times—newspapers are media, artworks are media—and at some point, it just becomes unanswerable.
So then the question becomes: What’s the boundary between fine art and media art?
And lately, I’ve started to feel that maybe we do need to draw some kind of boundary—like, maybe using digital tools is a key characteristic.
That’s something I’ve been thinking about recently.
I also think of media as “something in the middle”—something that can reflect or project something else.
So to me, “media” can be interpreted in many ways.
But when it comes to “media art,” I looked up the definition, and apparently, it usually refers to art that involves digital technologies. That seems to be the common understanding.
So when we talk about media art, it gets a bit too broad.
Like we’ve said many times—newspapers are media, artworks are media—and at some point, it just becomes unanswerable.
So then the question becomes: What’s the boundary between fine art and media art?
And lately, I’ve started to feel that maybe we do need to draw some kind of boundary—like, maybe using digital tools is a key characteristic.
That’s something I’ve been thinking about recently.
혜림> 그니까 이게 아무래도 ‘Fachwort’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사람하고 뭔가 좀 폭 넓게 접근하는 사람하고 이게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지않나 그런 생각…
Hyelim: Yeah, I think because it’s a “Fachwort” (a technical term), the way people approach it really differs.
If someone approaches it with that in mind, and someone else interprets it more broadly, misunderstandings can definitely happen.
If someone approaches it with that in mind, and someone else interprets it more broadly, misunderstandings can definitely happen.
하늬> 그런 어떤 서로의 관점의 차이가 있었던 건가요.
Hani: So would you say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spectives?
혜림> 관점의 차이라기보다 이게 어쨌든 기획을 이미 조금 정해놓은 상태에서 합류를 해서 (혜윤이가)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했었죠.
Hyelim: It wasn’t exactly a difference in perspectives.
It’s just that the concept was already somewhat defined when Hyeyun joined, so it naturally took some time for her to fully understand it.
It’s just that the concept was already somewhat defined when Hyeyun joined, so it naturally took some time for her to fully understand it.
혜윤> 언니는 윤주 언니랑 이미(테마가) 정해져 있으니까 한 번도 남한테 이렇게 아주 자세히까지 설명한 적은 없고 저는100%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게 뭔가 연구 단계가 있으면 초반에 있는 느낌은 아니니까 이미 조금 진행된 후의 느낌 이니까. 거기서 조금 시간이 좀 걸렸었던 것 같아요.
Hyeyun: Yeah, because the theme was already somewhat set between you and Yunju, and you had never really explained it to someone in depth before.
Whereas I wanted to understand it 100%.
So it wasn’t like we were at the early research stage—it was already underway.
That’s probably why it took me a while to catch up.
Whereas I wanted to understand it 100%.
So it wasn’t like we were at the early research stage—it was already underway.
That’s probably why it took me a while to catch up.
하늬> 근데 그랬을 때 좀 더 좀 이렇게 어떤 생각지도 못한 질문 받았을 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자기 생각을 재정립하는 과정도 좋았을 것 같아요.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Hani: But I feel like being asked unexpected questions like that could’ve helped you reframe and clarify your ideas. That must’ve been interesting, no?
채빈> 미디어라고 했을 때 저도 기본적으로는 디지털과 연관 지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뭔가 턴온이 가능한 껐다 켰다가 되는 그런 거를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광판도 어떤 신호가 있는 이런 류를 더 보편적인 미디어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아니면 라디오 뭐 그런. 근데 요새는 이상하게 신문 같은 종이 매체를 미디어라고 불렀을 때 살짝 어색한 느낌이 있어요. 요새 들어서 이렇게 시대가 변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진 저도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뭔가 옛날에 되게 보편적으로 미디어라고 불렸던 게 지금은 저한테 살짝 어색하게 된 것 같아요.
Chaebin: When I think of media, I also usually associate it with digital.
So I tend to picture something that you can turn on and off.
Like electronic displays, or anything that gives off signals—those feel like more “typical” media.
Computers, radios, etc.
But these days, for some reason, I find it a bit odd to refer to newspapers as “media.”
I’m not sure if it’s just a generational shift, but it feels strange now—even though it used to be a standard term. I don’t know why that is.
So I tend to picture something that you can turn on and off.
Like electronic displays, or anything that gives off signals—those feel like more “typical” media.
Computers, radios, etc.
But these days, for some reason, I find it a bit odd to refer to newspapers as “media.”
I’m not sure if it’s just a generational shift, but it feels strange now—even though it used to be a standard term. I don’t know why that is.
혜림> 우리는 어쨌든 미디어라는 단어가 특정 맥락에서는 'Fachwort'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어에서는 외래어로서 미디어라고 지칭할 때도 있고 '매체mae-chae (medium)'라는 말로 따로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맥락을 구분해서 쓸 때가 있고 아닐때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니까 어쨌든 '미디어'의 의미가 되게 광범위하게 있고 이걸 약간 경계 없이 쓰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는 해석의 혼동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 매체, 대중매체, 전달매체 등은 외래어인 '미디어'로 표현 되기도 하나, 예술 영역에서 표현 매체, 전달 매체(medium)를 의미할 때는 외래어 대신 고유어 '매체mae-chae'가 사용된다. 그러나 이 매체라는 용어는 일상적, 보편적 영역에서는 주로 언론, 언어적 전달 매체를 의미하는 데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맥락 언어인 한국어에서는.미디어라는 단어가 혼용적이며 광범위하게 쓰인다고 볼 수 있다.
Hyelim: In Korean, “media” is sometimes used as a loanword, but we also have the native word mae-chae (매체), which means medium. And the distinction between these two isn’t always clear-cut. Sometimes we use “media” in the context of mass media, or communication media, while mae-chae is more often used in the arts to refer to modes of expression or transmission.
But the line between the two isn’t always well defined, especially in high-context languages like Korean. So that’s probably why there’s a lot of interpretive confusion.
(In Korean, the native word 매체 (mae-chae) is often used in artistic contexts to refer to expressive or communicative mediums. However, in everyday language, terms like “mass media” or “media” are generally used with the loanword ‘media.’ The word is thus broad and often applied without clear boundaries.)
But the line between the two isn’t always well defined, especially in high-context languages like Korean. So that’s probably why there’s a lot of interpretive confusion.
(In Korean, the native word 매체 (mae-chae) is often used in artistic contexts to refer to expressive or communicative mediums. However, in everyday language, terms like “mass media” or “media” are generally used with the loanword ‘media.’ The word is thus broad and often applied without clear boundaries.)
혜윤> 우리 처음에 전시 제목 고민했을 때 0과 1의 세계를 탐구하는 그런 맥락을 가진 제목도 생각했던 게 기억나는 거 같아요. 주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yeyun: I remember when we were brainstorming exhibition titles, we considered names that explored the world of 0s and 1s.
Juyoun, what do you think?
Juyoun, what do you think?
주윤> 다 말씀 잘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근데 주제가 뭐였죠? 미디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미디어 저는 뭐 저도 매개한다, 매개하는 역할에 좀 초점을 좀 많이 두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 매개를 통해서 어떠한 특정 시각과 태도를 생산하는지에 흥미점을 가지고 미디어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뭐 사실상 어떤 데피니션을 내리려고 생각을 많이 하진 않고 그냥 뭔가 봤을 때 이 렌즈를 통해서만 보여지는 어떤 그런 그게 있다면 흥미를 가지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Juyoun: I think you’ve all expressed it really well already… Wait, what was the question again?
Ah, how we interpret “media.”
Yeah, I tend to focus on the “mediating” aspect—the role of transmission. And I’m interested in how media generates specific perspectives or attitudes. I’m not trying to define it too strictly, but when I encounter something that only becomes visible through a certain lens, I find that really intriguing.
Ah, how we interpret “media.”
Yeah, I tend to focus on the “mediating” aspect—the role of transmission. And I’m interested in how media generates specific perspectives or attitudes. I’m not trying to define it too strictly, but when I encounter something that only becomes visible through a certain lens, I find that really intriguing.
혜림> 맞아요. 그리고 그 아까 질문하신 거에 지금 대답을 해보자면
Hyelim: Right. And to answer the earlier question—
혜윤> 무슨 질문인지도 언급해 주세요.
Hyeyun: Please mention what the earlier question was.
혜림> 뭐였냐면 이거였죠 이런 예상치 못한 질문을 통해서 이제 좀 의미를 다시 되짚어보는, 의미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되짚어 보는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뭔가 확실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상업 예술이나 대중 예술은 아니니까. 어쨌든 모두를 보편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한계가 반드시 존재하고 그걸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Muss’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다 내 말에 다 공감해야 돼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와서 뭐 공감되는 사람은 공감하는 거고, 뭐 아닌 사람은 뭐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구나 뭐 그냥 그 정도. 약간 이게 좀 어떤 부분을 버리고 어떤 부분 안고 가야 될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
Hyelim: It was about how unexpected questions can lead you to revisit and clarify meanings in your work.
And to respond to that: what we’re doing isn’t commercial or mass-oriented art.
So there are limits when it comes to universal understanding, and honestly, there’s no must that says everyone has to fully relate to it.
We’re not making work that demands complete agreement or emotional resonance from everyone.
If someone connects with it, great. If not, maybe their interests lie elsewhere.
It made me think more about which parts of my work I want to hold onto, and which parts I can let go of.
And to respond to that: what we’re doing isn’t commercial or mass-oriented art.
So there are limits when it comes to universal understanding, and honestly, there’s no must that says everyone has to fully relate to it.
We’re not making work that demands complete agreement or emotional resonance from everyone.
If someone connects with it, great. If not, maybe their interests lie elsewhere.
It made me think more about which parts of my work I want to hold onto, and which parts I can let go of.
하늬> 근데 예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전부 다를 잘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예체능, 미디어 중에서도 비디오 아트 중에서도 비디오 아트에서 내러티브를 가진 거냐 아니면은 감각적으로만 그중에서도 쭉쭉 들어가면 진짜 세밀해질 수 있는데, 그냥 그거를 더 세밀하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막 이렇게 '국영수' 다 잘하는 것처럼 그럴 필요는 없다.
Hani: But isn’t that kind of what art is? You don’t need to be good at everything.
Even within the arts—or within media art, or video art—there are so many levels of specificity.
It’s not about being good at everything like studying math, science, and English.
What matters is going deep into one area.
Even within the arts—or within media art, or video art—there are so many levels of specificity.
It’s not about being good at everything like studying math, science, and English.
What matters is going deep into one area.
윤주> 주문한 버블티가 왔으니… 하늬님은 안시키셔서.... 제가 시킨 거 드실래요.
Yunju: My bubble tea has arrived… Hani, you didn’t order anything, right? Do you want mine?
하늬> 아니에요.
Hani: No, thank you.
혜림> 마테라도 마테나 맥주라도 마테를 저기 노란 박스인가 가시면
Hyelim: You can get some mate or beer from the yellow box over there.
하늬> 감사합니다.
Hani: Thank you.
윤주> 잠시 멈춰주시겠어요.
Yunju: Can we pause for a moment?
…
혜림> 저희 학교 교수님중에 디터 다니엘스 라고 미디어 아트 쪽으로 연구 엄청 오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백남준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수업 때마다 좀 그런 파트를 하나 껴놓고
Hyelim: One of our professors at my school, Dieter Daniels, has been researching media art for a very long time. He’s apparently a huge fan of Nam June Paik. So he often incorporates that kind of material into his lectures.
윤주> 마지막으로 한 수업이 미디어에 비친 자화상에 대한 이론을 다루셨었어요. 그리고 인제 저희 프로젝트 겨울 전시회도 참여를 해주기로 하셔가지고, 되게 관심도 많으시고 학생들 지원도 잘해주시고
Yunju: In our last class, we talked about theories of self-portraiture through media. He’s also agreed to participate in our winter exhibition, which is exciting. He’s very supportive of students and their work.
혜림> 교수님이(프로젝트에) 참여하세요. 강연으로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열릴 예정이니 여러분도 참여하시죠. 맞아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였죠.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미디어 인지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미디어 인지 체계라는게 사실 저 스스로는 어렸을 때 처음 접한 미디어가 엄마가 읽어준 동화책 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엄마 목소리로 그 동화책 읽는 걸 들으면서 상상력을 되게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게 쭉 시작이 되면서 뭔가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 가끔은 되게 산, 숲속 이런 데를 밤에 차 타고 지나가거나 할 때 뭔가 무섭잖아요. 누가 따라올 것 같고, 괴물이 튀어나올 것 같고, 이런 상상을 끊임없이 하는 게 어쨌든 그런 것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상력을 일으키는 지점이.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다음엔 또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하는 게 제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접했을 때 느끼는 반응에 되게 많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 작업에서는 '미디어틱…
Hyelim: He’ll be joining the project as a lecturer. It’s going to be streamed online, so I hope you all join as well.
Right, so—where were we?
Since we talked about “media,” let’s move on to media-based cognitive systems.
Personally, my first encounter with media as a child was listening to my mom read storybooks aloud. Her voice really stimulated my imagination.
From that point on, it was like a continuous chain of imaginative thinking. For instance, whenever I traveled—especially if we were driving through forests or mountains at night—I’d get scared. I’d imagine someone following us, or that a monster might jump out.
I really believe those media experiences shaped the way I think.
Then I moved on to animation, dramas, films… and those experiences deeply affected how I respond to things in everyday life.
That’s what led me to develop the concept of media-based cognitive systems in my work...
Right, so—where were we?
Since we talked about “media,” let’s move on to media-based cognitive systems.
Personally, my first encounter with media as a child was listening to my mom read storybooks aloud. Her voice really stimulated my imagination.
From that point on, it was like a continuous chain of imaginative thinking. For instance, whenever I traveled—especially if we were driving through forests or mountains at night—I’d get scared. I’d imagine someone following us, or that a monster might jump out.
I really believe those media experiences shaped the way I think.
Then I moved on to animation, dramas, films… and those experiences deeply affected how I respond to things in everyday life.
That’s what led me to develop the concept of media-based cognitive systems in my work...
…
윤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Yunju: An accident has occurred.
하늬> 어떡해 제가 한 건가요?
Hani: Oh no—was it me?
윤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혼자 떨어졌는데. 근데 이게 다 위험해요. 이미 끝났어 이미 저 아이는 사망했어.
Yunju: No, no, no. It just fell on its own. But it’s dangerous. It’s already too late. That thing is dead.
…
혜림> 그래서 교수님 강연... 아니다.
Hyelim: Right, back to the lecture... or not.
혜윤> 언니가 그 뭐지... 생각하면
Hyeyun: What were you thinking again?
혜림>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작업에는 그게 제 작업 스테이트먼트에는 그거를 미디아틱, 시네마틱 인지 체계로 정해서 저는 이제 그런 뭐 인지 체계로 사고하고 그걸 Arbeitsweise로 쓴다 이렇게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또 한국인들은 작업에 내러티브를 많이 사용하고 이러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한국인들이 작업하는 방식이 어쨌든 이게 또 독일친구들 작업을 보면 내러티브라는 거를 잘 안 쓰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그리고 여기는 막 그 영화나 드라마 이런 소프트 파워 산업이 어쨌든 자국에서 뭔가 크게 이렇게 활성화된 거는 비교적으로 별로 없고 그리고 영화나 이런 것들도 할리우드 쪽에서 하는 걸로 보통 여기도 좀 문화권이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만 조금 독단적으로 자국에서 생산한 컨텐츠를 자국민들이 제일 많이 소비를 하고 이러는 거에서도 좀 이런 내러티브적인 생각이 좀 사고가 발달한 것 같기도 하고. 컨텐츠들에 내러티브가 많으니까.
Hyelim: Ah yes, yes—
So in my artist statement, I define my process as working through a media-based, cinematic cognitive system.
It’s how I think and how I develop my work.
And another thing I’ve noticed is that Korean artists tend to use a lot of narrative in their practice.
That made me curious, because German artists often don’t use narrative much at all.
There also seems to be a cultural difference: in Germany, the domestic soft power industries—films, dramas, etc.—aren’t as developed or dominant.
A lot of people here consume Hollywood content rather than their own.
But in Korea, it’s the opposite—Koreans are the main consumers of Korean content.
I think that shaped a more narrative-driven way of thinking in our culture.
So in my artist statement, I define my process as working through a media-based, cinematic cognitive system.
It’s how I think and how I develop my work.
And another thing I’ve noticed is that Korean artists tend to use a lot of narrative in their practice.
That made me curious, because German artists often don’t use narrative much at all.
There also seems to be a cultural difference: in Germany, the domestic soft power industries—films, dramas, etc.—aren’t as developed or dominant.
A lot of people here consume Hollywood content rather than their own.
But in Korea, it’s the opposite—Koreans are the main consumers of Korean content.
I think that shaped a more narrative-driven way of thinking in our culture.
혜윤> 약간 그런 중심이라는 데 진짜 공감했어. 한국인들이 되게 서사나 스토리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
Hyeyun: I really agree with that. I’ve always felt that Koreans tend to have a very narrative- or story-centered way of thinking.
채빈> 저는 뭔가 우리나라에 되게 구전설화도 많고 뭔가 동화나 막 이런 전설 이런 것도 보면 항상 기승전결이 되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게 살짝 영향이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작업할 때는 저는 글이 없으면 시작을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촬영을 먼저 해 아니면 뭐를 먼저 해 이게 안 되고 글이 무조건 먼저 나와야지만 작업이 시작이 될 수 있는 약간 좀 이상한게 있어요.
Chaebin: I think part of it comes from our tradition of oral storytelling.
A lot of Korean folktales and children’s stories have such a clear structure—beginning, middle, climax, conclusion.
That must have influenced us too.
Personally, I can’t even begin working unless I write something first.
I can’t start by filming or doing visuals—I have to start with text. It’s a weird habit.
A lot of Korean folktales and children’s stories have such a clear structure—beginning, middle, climax, conclusion.
That must have influenced us too.
Personally, I can’t even begin working unless I write something first.
I can’t start by filming or doing visuals—I have to start with text. It’s a weird habit.
혜림> 저도 좀 그래요.
Hyelim: I’m the same.
채빈> 진짜 뭐 데드라인이 얼마나 왔건 뭐고 그냥 시작이 안 돼 글이 없으면 그냥. 그래서 그 글을 쓰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제 뭐 다른 영감이 필요하다 이러면 뭐 영화를 보던지 재밌는 책을 읽던지 이런 거에서도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지... 한국이 되게 빨리빨리 변하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받아들이는 속도도 엄청 빠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제 인지 체계는 뭔가 그런 미디어에 진짜 딱 맞춰져 있는 느낌. 뭐 예를 들어서 맨날 저 맨날 '아 gpt한테 물어볼게요' 맨날. 그 1년 전만 해도 gpt가 없었거든요. 없었었고 얘가 말도 잘 못하고 이상한 거 대답하고 그랬어서 뭐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약간 없으면은 불편해요. 좀 그러니까 gpt가 생기고 나서 이걸 구독하고 뭐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 이런 거 쓴 거 정말 정말 몇 손가락에 꼽을 정도고 무조건 뭔가 이게 뭐가 생기면은 아 지피티야 이거 뭔데 이거 알려줘 뭐 해줘 막 약간 이러고 심지어 그 예를 들어서 뭐 아티스트 스테인먼트 같은 거 쓸 때도 이거 보고 한번 퇴고해 줘 약간 이런 것도 부탁하고. 그러니까 뭔가 점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기술과 미디어 그런 것들이 점점 인간이 더 뗄 수 없는, 굉장히 얽히고 설키는 뭔가가 되어 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요새 하고 있어요.
Chaebin: No matter how close the deadline is, if I don’t have the writing, I just can’t start.
Sometimes I need inspiration, so I watch films or read interesting books.
Also, Korea changes so fast, so I think people are used to absorbing information really quickly.
And I feel like my current cognitive system is deeply shaped by that kind of media environment.
For example, now I constantly say things like, “I’ll ask GPT.”
A year ago, ChatGPT wasn’t even reliable—it didn’t work well. But now, it’s become essential.
I barely use Google or Naver anymore. I ask GPT for everything—even when writing artist statements, I ask it to proofread.
So yeah, I think media and technology are becoming inseparable from how we think and live.
Sometimes I wonder if they’re turning into something deeply entangled with human existence.
Sometimes I need inspiration, so I watch films or read interesting books.
Also, Korea changes so fast, so I think people are used to absorbing information really quickly.
And I feel like my current cognitive system is deeply shaped by that kind of media environment.
For example, now I constantly say things like, “I’ll ask GPT.”
A year ago, ChatGPT wasn’t even reliable—it didn’t work well. But now, it’s become essential.
I barely use Google or Naver anymore. I ask GPT for everything—even when writing artist statements, I ask it to proofread.
So yeah, I think media and technology are becoming inseparable from how we think and live.
Sometimes I wonder if they’re turning into something deeply entangled with human existence.
하늬> 근데 저는 사실 제 학교가 아무래도 영화 쪽에 좀 있는 학교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더 서사를 많이 쓴다라는 생각은 잘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인들이 되게 빠른 얼리 어댑터인 거가 사실 새로운 매체가 이렇게 막 chat Gtp나 이런 거 나오면은 그걸 이렇게 해보고 거기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는지 실험하고 이런 쪽이 좀 강한 거는 확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Hani: Actually, since my school focuses more on film, I hadn’t really thought about the idea that “Koreans use more narrative.”
But listening to you all, I can see how Koreans tend to be early adopters—when new media like ChatGPT comes out, people quickly try it and experiment with how stories can emerge from it. That does seem quite distinctive.
But listening to you all, I can see how Koreans tend to be early adopters—when new media like ChatGPT comes out, people quickly try it and experiment with how stories can emerge from it. That does seem quite distinctive.
혜윤> 미디어 인지 체계에 뭔가 느끼시는 바가 있으신지. 방금 내가 끊어버렸나요? 윤준님은 혹시 있으신가요?
Hyeyun: Do any of you feel anything specific when you think about media-based cognition?
Wait, did I just interrupt someone? Yunju, do you have any thoughts?
Wait, did I just interrupt someone? Yunju, do you have any thoughts?
윤주> 일단 미디어가 뭔지도 아까 대답을 안 했었는데… 처음에 프로젝트 시작했을 때 저는 미디어가 약간 주입된 사고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게 우리가 진짜 무의 상태로 태어나서 사고하게 된 게 다 외부에서 입력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게 일단 미디어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마다 뭐 신문도 미디어고 뭐 영화도 미디어고 이렇게 말 하는 게 영향을 끼쳐서 사고하게 만든 거로부터 왔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한국이 그렇게 서사 중심적이라고 생각한 건 이제 한국의 티비 쇼 같은 게 서사를 엄청 많이 주입하잖아요. 막 슈퍼스타 케이 같은 것도 서사 있으면 막 올라가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한국은 약간 서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모든 예능 프로그램과 모든 드라마의 서사를 자꾸 주입하면서 이게 사람들한테 자동적으로 입력되고 그리고 사람들도 이렇게 자식을 돌볼 때 자식한테 뭘 가르쳐 줄 때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유를 이렇게 뭔가 독일인들은 그거 안 돼 이렇고 뭔가 한국은 교육을 할 때도 좀 더 서사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고 해야하나? 너가 그렇게 하면 뭐 누가 슬퍼하고 어쩌고 저쩌고.
Yunju: I guess I didn’t answer the earlier question either—what I think media is.
When this project first started, I saw media as something tied to “implanted thought.”
We’re born in a state of nothingness, and everything we learn—our thoughts, ideas—all come from the outside.
So in that sense, everything is media.
That’s why people say things like, “Newspapers are media,” or “Movies are media.”
I believe those things shape the way we think.
And when it comes to Korea’s narrative tendencies, I think Korean TV shows really inject narrative into everything.
Like in Superstar K, contestants who have a dramatic backstory are more likely to advance.
So I think Koreans really love narrative, and that it ends up being constantly reinforced by all kinds of programs and dramas.
It gets embedded into people automatically.
Even in parenting, I think Koreans tend to explain things through stories.
Instead of just saying “Don’t do that,” they’ll say, “If you do that, someone will get sad…”
They explain things emotionally and narratively.
When this project first started, I saw media as something tied to “implanted thought.”
We’re born in a state of nothingness, and everything we learn—our thoughts, ideas—all come from the outside.
So in that sense, everything is media.
That’s why people say things like, “Newspapers are media,” or “Movies are media.”
I believe those things shape the way we think.
And when it comes to Korea’s narrative tendencies, I think Korean TV shows really inject narrative into everything.
Like in Superstar K, contestants who have a dramatic backstory are more likely to advance.
So I think Koreans really love narrative, and that it ends up being constantly reinforced by all kinds of programs and dramas.
It gets embedded into people automatically.
Even in parenting, I think Koreans tend to explain things through stories.
Instead of just saying “Don’t do that,” they’ll say, “If you do that, someone will get sad…”
They explain things emotionally and narratively.
하늬> 미디어랑 내러티브의 접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미디어도 얘기한 것 같고, 내러티브도 얘기한 것 같아서 이 접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같이 타이틀로 엮은 건지 궁금하기도
Hani: I’m curious—how do you see the connection between media and narrative?
We’ve been talking about both, and I wonder how you’ve linked them together in your project title.
We’ve been talking about both, and I wonder how you’ve linked them together in your project title.
혜림> 저 같은 경우는 접점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인 거죠. 왜냐하면, 미디어는 어쨌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엔 그냥 역사적으로 밟아봤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전쟁 직후 상황부터 뭔가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키자 그렇게 해서 뭔가 경제적으로 기반을 마련해 놓고 뭔가 여기서 어떻게 강대국이 되냐 이런 생각을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진짜 강하게 뼛속 깊이부터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뭔가 강대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소프트 파워 얘기가 나왔을 거고, 그런 소프트 파워를 이제 김대중대통령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다른 나라를 벤치마킹을 하면서 살아 남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쨌든 일본이 그 전후 전쟁 특혜로 강대국이 되고 그 자본으로 애니메이션 뭐 티비쇼 이런 거를 발전시키고 생산해내고 거기서 우리는 영향을 받아서 어떤 그 일본의 그 특유의 그런 애니메이션, 신파적인 그런 것에서도 일부 영향을 받았고. 그 내러티브랑 미디어의 접점을 후에 찾았다기보다는 같이 갔었던것 같아요.
Hyelim: For me, it’s not so much a connection between the two—it’s more that they’re one and the same.
Historically speaking, our society has always been about survival—especially in the post-war era.
We had to rebuild, establish economic foundations, and eventually think about how to become a strong nation.
That way of thinking was passed down strongly from our grandparents’ generation.
Then came the idea of soft power.
Starting with President Kim Dae-jung’s era, Korea began benchmarking other countries—especially Japan, which benefited from postwar economic advantages and developed its own media industries like animation and TV.
We were deeply influenced by that.
So for me, media and narrative didn’t become linked at some later point—they were always interwoven from the beginning.
Historically speaking, our society has always been about survival—especially in the post-war era.
We had to rebuild, establish economic foundations, and eventually think about how to become a strong nation.
That way of thinking was passed down strongly from our grandparents’ generation.
Then came the idea of soft power.
Starting with President Kim Dae-jung’s era, Korea began benchmarking other countries—especially Japan, which benefited from postwar economic advantages and developed its own media industries like animation and TV.
We were deeply influenced by that.
So for me, media and narrative didn’t become linked at some later point—they were always interwoven from the beginning.
채빈> 저는 이야기가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생명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미디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흐름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서 그 장면만을 보여주고 싶어 이랬을 때는 뭔가 조각을 해서 내가 그 장면을 되게 극대화시켜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그 장면에 대한 사진이나 그런 거. 사진도 미디어긴 한데. 뭔가 이야기는 흘러가는, 멈춰있지 않은 뭔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지 '내러티브' 했을 때 가장 잘 맞는 건 그런 같아요. 어쨌든 모르겠어요. 뭔가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주인공이 누구든 거기 나오는 사람의 어떤 뭔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뭔가가. 근데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뭔가를 기승전결을 따라갔던 따라가지 않던 그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흐름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미디어가 제일 적합한 매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Chaebin: I think of stories as living things.
They move. They have vitality.
And I think media is the best way to express that.
Because when you want to unfold a scene or a flow, media can do that.
Say I want to show just one vivid moment—sure, I could sculpt or photograph it.
But stories keep moving.
So I think media is the most fitting medium for showing that kind of flow.
I don’t know—when we tell stories, no matter who the protagonist is, they always have something they want to say.
And whether or not the narrative has a traditional arc, media allows us to unfold and explore that process.
I think that’s why media and narrative go so well together.
They move. They have vitality.
And I think media is the best way to express that.
Because when you want to unfold a scene or a flow, media can do that.
Say I want to show just one vivid moment—sure, I could sculpt or photograph it.
But stories keep moving.
So I think media is the most fitting medium for showing that kind of flow.
I don’t know—when we tell stories, no matter who the protagonist is, they always have something they want to say.
And whether or not the narrative has a traditional arc, media allows us to unfold and explore that process.
I think that’s why media and narrative go so well together.
하늬> 흐름이라는 말 되게 좋은 지점인 것 같아요. 미디어의 흐름과 내러티브. 약간 미디어 자체를 사용하는 게 내러티브를 보여주고 함께 나누는 데 가장 직관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Hani: I think “flow” is such a great keyword here.
Maybe media is such an intuitive medium for expressing and sharing narrative because of that very quality—its flow.
Maybe media is such an intuitive medium for expressing and sharing narrative because of that very quality—its flow.
윤주> 약간 그냥 갑자기 아주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무언가를 현상이 있으면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약간 이해를 하는데 감정적인 부분이 조금 더 약간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어서 내러티브적인 요소가 조금 더 많이 영향을 끼친 게 아닐까...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Yunju: This just came to me randomly—but I think Koreans have a tendency to want to understand phenomena.
And that process of understanding is often shaped more emotionally than rationally.
So maybe that’s why narrative has such a strong influence in our culture.
And that process of understanding is often shaped more emotionally than rationally.
So maybe that’s why narrative has such a strong influence in our culture.
혜림> 어떻게 보면은 거의 (까먹기 전에 아까 질문을 하나를 마저 해보자면) 유일하게 내러티브가 있는 작업인데(주윤님 작업이) 설치를 하셨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좀 뭔가 하실 말씀 있으신지 뭔가 상황 설정을 어떻게 보면 한 거잖아요. 내러티브를. 그래서 뭔가 영상을 한번 해볼 생각은 없었는지
yelim: Speaking of that—(before I forget, let’s address the earlier question)—Juyoun, yours is actually the only piece in this exhibition that clearly includes a narrative, right? And you presented it as an installation.
So I was curious if you had any thoughts about that—about how you structured the scene, in a way. Did you ever consider turning it into a video?
So I was curious if you had any thoughts about that—about how you structured the scene, in a way. Did you ever consider turning it into a video?
주윤> 저는 작업을 할 때 엄청 퍼즐처럼 맞춰가는 타입이어서. 시작은 예전에 이제 런던의 어떤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 문에다가 문고리를 엄청 많이 붙여놓은 샵을 봤어요. 아마 문고리 판매하는 곳 같았는데, 제 눈엔 그게 너무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어놓고 이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책을 읽었는데 포스트 아포칼립스 적인 요소가 보였고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상황이 설정됐다. 처음 작업은 사실 좀 더 약간 크라이트스 컬처(?) 같은 결이었어요. 그래서 그 배가 사실은 주가 되는 거였고. 조금 더 빛이 나는 배를 만들어 보자는 게 있었는데, 조금 더 단순화 시키자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단순화 시키고 단순화 시키고 하다 보니까 등대와 배, 라이트 커뮤니케이션이 주가 되어 작업이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다. 이걸 하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은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여기에 옮겨놓은 거야. 저한테는 약간 공간을 약간 제너레이트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영상 작업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전에 영상을 했었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상 자체에 대한 피로감이 있어서... 그리고 너무 제 인생 자체에서 핸드폰도 많이 하고 유튜브도 많이 하고 컴퓨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시까지 보러 와서 내 작업에서만이라도 나는 영상을 하고 싶지 않다는 개인적인 마음이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요즘은 사람들이 아트 보러 와도 하나를 오래 보는 시대가 아니어 가지고... 아직도 살짝 아쉬운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관객들이 미디어 아트를 보러 왔었을 때 다들 무언가 체험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지 해석에 대해서는 엄청난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은 약간 과학적 베이스가 엄청 잘 되어 있지 않은 거 이상은. 그래도 하나하나 도전해 보고 있어요.
Juyoun: When I work, I approach it like solving a puzzle.
This piece started when I was walking down a street in London and saw a shop with a door completely covered in doorknobs.
I think it was selling them, but to me it looked fascinating. I took a picture and kept it in mind.
Later, I read a book with post-apocalyptic themes, and something about that resonated.
So I started collecting these impressions and eventually built a scenario.
At first, the work had more of a crisis-culture kind of feeling.
Originally, the ship was supposed to be the main element—I wanted to make a glowing ship.
But I kept simplifying, and eventually focused on the lighthouse, the boat, and their light-based communication. That became the core.
The whole piece feels like a scene pulled from a movie and dropped into physical space.
For me, the idea of generating space was very meaningful.
And honestly, I didn’t consider making a video.
I’ve done video work before, but I got really tired of it.
In my everyday life, I already spend too much time with my phone, YouTube, and my computer.
So when people come to see my work, I didn’t want them to face yet another screen.
I had a personal desire to not make video.
That said, it’s also true that people today rarely watch things all the way through.
Even with media art, most people aren’t necessarily trying to interpret it deeply—they’re there for the experience.
Unless a piece is super scientific or highly structured, that’s just how it is.
Still, I’m continuing to challenge myself, one step at a time.
This piece started when I was walking down a street in London and saw a shop with a door completely covered in doorknobs.
I think it was selling them, but to me it looked fascinating. I took a picture and kept it in mind.
Later, I read a book with post-apocalyptic themes, and something about that resonated.
So I started collecting these impressions and eventually built a scenario.
At first, the work had more of a crisis-culture kind of feeling.
Originally, the ship was supposed to be the main element—I wanted to make a glowing ship.
But I kept simplifying, and eventually focused on the lighthouse, the boat, and their light-based communication. That became the core.
The whole piece feels like a scene pulled from a movie and dropped into physical space.
For me, the idea of generating space was very meaningful.
And honestly, I didn’t consider making a video.
I’ve done video work before, but I got really tired of it.
In my everyday life, I already spend too much time with my phone, YouTube, and my computer.
So when people come to see my work, I didn’t want them to face yet another screen.
I had a personal desire to not make video.
That said, it’s also true that people today rarely watch things all the way through.
Even with media art, most people aren’t necessarily trying to interpret it deeply—they’re there for the experience.
Unless a piece is super scientific or highly structured, that’s just how it is.
Still, I’m continuing to challenge myself, one step at a time.
혜림> 그 우리가 참여 작가 구성을 이제 할 때, 그니까 참여자를 모집하면서 작업끼리의 관계를 구성 할 때 어쨌든 이 서로 간의 연결점도 염두에 두고 했거든요. 약간 뭐 이게 서로의 작업 방식이나 작업의 테마, 결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얽히고 설켜 있는지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어서 좀 각자의 작업이 묘하게 조금씩 얽혀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주윤님하고 내 거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거나 뭔가 세트 구성 그니까 상황을 설정하고 그 작업물을 그냥 놓기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 구성까지 같이 하는 작업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영상이나 그런 이미지적인 것들이 있고 주윤님은 설치 작업 그니까 오브제로 딱 존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두개의 뭔가 비슷하고 좀 다른 반대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Hyelim: When we were selecting participating artists and shaping how their works would be connected, we really consider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The way artists work, their themes, the texture of their works—we wanted to show how they intertwine.
And there are subtle overlaps between everyone’s work.
For example, Juyoun’s piece and mine both involve dystopian elements and constructed sets.
We’re not just placing finished works into a space—we’re creating a whole environment where everything blends together.
In my case, I lean toward video and image-heavy work. Juyoun’s is more object-based installation.
So it was interesting to see how similar yet contrasting our approaches were.
The way artists work, their themes, the texture of their works—we wanted to show how they intertwine.
And there are subtle overlaps between everyone’s work.
For example, Juyoun’s piece and mine both involve dystopian elements and constructed sets.
We’re not just placing finished works into a space—we’re creating a whole environment where everything blends together.
In my case, I lean toward video and image-heavy work. Juyoun’s is more object-based installation.
So it was interesting to see how similar yet contrasting our approaches were.
주윤> 맞아요. 그리고 혜림 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히토 슈타이얼 작업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예전에 한 1년 전쯤 했던 작업 중에 히토 슈타이얼 책 보다가 되게 재미있어 가지고 시작한 작업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아 확실히 겹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Juyoun: Right. And Hyelim, you mentioned before that you like Hito Steyerl’s work.
I actually started one of my earlier pieces after reading her writing—it really intrigued me.
So when you said that, I definitely felt a connection between our approaches.
I actually started one of my earlier pieces after reading her writing—it really intrigued me.
So when you said that, I definitely felt a connection between our approaches.
혜림> 우린 모니터로 작업을 하는 게 많으니까 확실히 작업을 진짜 너무 오래 한 날은 핸드폰 쳐다보고서 쉬는 게 되지가 않는... 진짜로 약간 도파민이 이미 너무 자극이 돼 가지고 '아 유튜브 보면서 쉬다가 자야지' 이게 안 될 때가 있어. 너무 눈이 이미 피로해 가지고
Hyelim: Since we often work with monitors, I find that when I’ve been working too long on digital projects, even watching YouTube to relax doesn’t work anymore.
It’s like my dopamine’s already overloaded—
I think, “I’ll watch something light and go to bed,” but my eyes are just too exhausted.
It’s like my dopamine’s already overloaded—
I think, “I’ll watch something light and go to bed,” but my eyes are just too exhausted.
하늬> 저 진짜 약간 시체처럼 누워있을 때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뭐 진짜 벽만 보고 클렌징을 해요.
Hani: I totally get that. Sometimes I just lie down like a corpse and stare at the wall. That’s how I decompress.
혜림> 그 옛날에 그림 그릴 때는 작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뭔가를 풀어내는 위주였는데 디지털 작업은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해소하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 부분이 갑자기 뭔가 인생에서 빠져버려 가지고 같은 예술인데도 뭔가 풀어내는 과정이 다른 것 같다는 느낌? 확실히 아날로그만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거를 만들어내는 사람한테도 뭔가 좀 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숏폼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업적인 숏폼을 제작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Hyelim: Back when I used to draw, working on my pieces helped relieve stress and express emotions. But with digital work, I don’t get that same feeling of release while working. It’s like that aspect just disappeared from my life. Even though it’s still “art,” the process of expression feels different. There’s definitely something about analog work that you can’t replicate. Not just for the viewers, but also for the person creating it — it feels different.
These days, short-form content is everywhere. But we don’t really produce commercial short-form videos. Do you have any thoughts about that?
These days, short-form content is everywhere. But we don’t really produce commercial short-form videos. Do you have any thoughts about that?
하늬> 사실 요새 퍼포먼스 같은 것들도 이렇게 사람들을 관객을 딱 잡아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경우가 많이 있지도 않고. 예를 들어 작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비엔날레에서도 그냥 모래사장을 이렇게 쫙 깔아놓고 거기에 그냥 책 읽거나 아니면 모래 놀이하는 애들이나 그런 되게 거의 현실에서의 그냥 있는 상황 벌어지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의 것들을 보여주면서 되게 어텐션을 어떻게 디스오더링 하는지, 우리가 막 핸드폰도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뭐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그런 것들 주제인 퍼포먼스도 되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 비디오 작업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될 때도 많고 근데 그게 영화관에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깐 어떻게 하면 저는 관객의 어떤 그 관심, 보면서 흥미가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관객의 주목과 관심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게 맞는 건가 하는 그런 좀 모순적인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Hani: These days, with performances too, it’s rare to have an audience sit through something from beginning to end. I can’t recall the artist’s name, but at a biennale, someone spread sand across the floor, and the piece was just people reading books or kids playing in the sand. It was almost indistinguishable from everyday life — just normal things happening.
It was about how attention gets disordered — like how we jump from one thing to another on our phones. There are lots of performances now that address those ideas.
In contrast, the video works we do often require watching from start to finish, but they’re not shown in cinemas. So I find myself wondering how I can keep viewers interested throughout. At the same time, I question whether it's even right to try to hold their attention like that. It feels like a contradiction.
It was about how attention gets disordered — like how we jump from one thing to another on our phones. There are lots of performances now that address those ideas.
In contrast, the video works we do often require watching from start to finish, but they’re not shown in cinemas. So I find myself wondering how I can keep viewers interested throughout. At the same time, I question whether it's even right to try to hold their attention like that. It feels like a contradiction.
혜림> 제가 처에 미디어 다루기 전에 평면 작업할 때 어 그 무슨 뭐 되게 큐레이터였는지 뭐 하여튼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이쪽 관계자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계속 좀 오래 했었는데, 그분 약간 특징이 되게 시니컬하고 약간 다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그 비관적이라고 해야 되나
Hyelim: Before I started working with media, I did mostly two-dimensional work. There was someone in the field — I won’t name them — who taught at our school for a long time. They were known for being super cynical and kind of... pessimistic?
하늬> 염세적인
Hani: Yeah, nihilistic.
혜림> 맞아 염세적인 사람이었는데. 막 아 니네 어차피 다 작가 못돼. 뭐 여기서 뭐 작가 할 수 있는 사람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의 사람이었는데. 되게 항상 별로라고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비디오 작업에 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 1시간 넘는 비디오 작업 얘기를 하면서 '이런건 뭐 다 보라고 만든 거 아니죠'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거에요. 전시장을 가면 학생 입장으로서 '아 이거 보고 다 이해해야 될 텐데, 그래야 배울 텐데, 좀 뭔 말인지 좀 이렇게 내가 좀 해석을 조금 해야 될 텐데' 이러면서 막 부담을 느끼면서 '왜 이 사람은 이런 긴 비디오 작업을 했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데 되게 지나가는 말로 '이거는 다 보라고 만드는 거 아니죠'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약간 그 말이 사실 조금 띵했었거든요.
Hyelim: Right, very nihilistic. They used to say stuff like, “None of you are going to make it as artists anyway.” I always took their classes thinking, “Ugh, this sucks.”
One day they were talking about video works that were over an hour long and just brushed it off saying, “This wasn’t made for people to watch the whole thing, right?”
As a student, I’d go to exhibitions thinking, “I have to watch this all the way through to understand and learn from it,” feeling pressure to interpret and make sense of it.
But hearing that offhand comment — “It’s not made for you to watch the whole thing” — really stuck with me.
One day they were talking about video works that were over an hour long and just brushed it off saying, “This wasn’t made for people to watch the whole thing, right?”
As a student, I’d go to exhibitions thinking, “I have to watch this all the way through to understand and learn from it,” feeling pressure to interpret and make sense of it.
But hearing that offhand comment — “It’s not made for you to watch the whole thing” — really stuck with me.
하늬> 그치 그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어떻게 다 하나하나 내 눈에 들어오는 걸 다 뭔가 일일이 해석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Hani: Yeah, yeah. I mean, we can’t possibly go through everything in life and analyze each little thing one by one.
혜림> 그 부분도 일부 맞는 말이고 오히려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할 수도 있겠다.
Hyelim: Exactly. In a way, that’s true. And maybe it’s worth making work with that mindset in mind.
윤주> 어쨌든 영상 자체가 모두 기승전결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Yunju: Anyway, a video doesn’t always need a traditional beginning, middle, and end.
혜림> 뭔가 이 부분만 보고서도 느낄 수 있는게 있고, 맥락 없이 뭔가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부분도 확실히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약간 그런 시간 베이스라는 거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든... 그런 말들 때문에
Hyelim: Sometimes just watching a small portion of a video is enough to get something from it. Even without context, there’s still something you can feel. So comments like that have actually helped reduce my anxiety around time-based work.
하늬> 그런데 이제 사실 작업마다 다르니까.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안 봐도 되는 작업은 1초를 보든 한 시간을 봐도 똑같은, 굉장히 시간과 공간의 이분법이 사라지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는 작업들도 어쨌든 많고. 근데 또 관객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잡아두려는 작업들도 많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태도를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게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 작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꼭 봐야 돼 우기면 우겨서 그렇게 보게 만들고 또 아닌 작업들은 그 작업만의 태도 그게 태도가 되는
Hani: But it really depends on the piece. Some works don’t require you to watch from beginning to end. Whether you watch one second or one hour, it’s the same — like time and space have been flattened. On the other hand, there are works that really try to hold your attention from start to finish.
It’s tricky, but I think you just need to be clear about your approach. If you want viewers to watch from beginning to end, then be bold about that and make them stay. If not, that non-insistence becomes your work’s attitude too.
It’s tricky, but I think you just need to be clear about your approach. If you want viewers to watch from beginning to end, then be bold about that and make them stay. If not, that non-insistence becomes your work’s attitude too.
채빈> 저는 근데 약간 좀 이왕 만드는 거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상황이어서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항상 어떻게 더 시각적으로 흥미롭게 만들지 지금 이 부분 너무 루즈해지는 것 같은데, 이걸 엄청 신경 쓰거든요.
Chaebin: Personally, I’m in the mindset of — “If I’m going to make it, I want people to watch it.” So I’m always thinking about how to make it more visually interesting. Like, “This part’s dragging a bit too much,” and I obsess over those things.
하늬> 저도 그거 못 버리는 거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아 물론 막 재밌어야 되는 건 아니긴 하잖아요. 작업이. 근데 뭔가 어쨌든 영상이라는 거를 하면 이게 뭐 1,2 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내가 지금 6개월 갈아서 지금 내 이야기 만들었는데 좀 앉아서 봐라. 약그니까 이렇게 좀 앉아있게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변화를 많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3D 스캔을 쓸까'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블렌더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Hani: Yeah, I feel like I can’t let go of that either.
Of course, a piece doesn’t have to be entertaining. But when it’s video, it’s not like it ends in one or two minutes. I’ve spent six months crafting this story — I want people to sit down and watch it. So I try to introduce more variation just to make it watchable. I even ask myself things like, “Should I add a 3D scan here?” or “Should I use Blender?”
Of course, a piece doesn’t have to be entertaining. But when it’s video, it’s not like it ends in one or two minutes. I’ve spent six months crafting this story — I want people to sit down and watch it. So I try to introduce more variation just to make it watchable. I even ask myself things like, “Should I add a 3D scan here?” or “Should I use Blender?”
채빈> 그리고 또 그 유튜버 중에 한국에 계신데, 유튜브는 어쨌든 조회수가 연결이 되잖아요. 돈이 나오는 거에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요새 사람들이 그런 숏폼도 많이 나오고 이런 거 긴 거를 볼 수 있는 능력? 인내심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10초 건너뛰기를 했을 때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 왜 바뀌었지 이렇게 해서 뒤로 가기를 하게 만들게 하는. 그렇게 영상을 만든대요 자기는. 그래서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에 이렇게 해서 집중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 동시에 또 어쩌라고 내가 이렇게 이런 방식을 써서 만들었는데 안 보면은 뭐 안 보는 거지 약간 이런 마음이 좀 반반적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그래서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좀 길게 봐줬으면 싶기도 하고 동시에 뭔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제 그냥 이거는 뭐 관람자의 몫이지 이런 반반의 느낌이 항상 있는 것 같아
Chaebin: There’s this Korean YouTuber I know who says that as people’s attention spans get shorter, they edit videos so that every time you skip 10 seconds, the scene changes. That makes viewers go, “Wait, what happened?” and rewind. So that’s one approach. But at the same time, I also feel like—whatever, I made it this way, and if people don’t want to watch it, then so be it. It’s like this constant push and pull. I worked so hard on it, I want people to take the time to watch it. But I also feel like I can’t do more. It’s up to the viewer now.
혜림> 그러니까 뭔가 또 하나 인간이 조금 희한하다라고 생각했던 포인트는 뭔가 딱 정지돼 있고 이렇게 있는 그림이나 아니면 가끔 되게 좀 앉아서 쉴 수 있게 볼 수 있게 만든 설치작업 같은 경우 또 우리가 진짜 오래 앉아서 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어쨌든 시각 자극이 있고 막 이런 나름의 어떤 내러티브가 있고 이런 건 또 보기가 좀 지루하다고 안 보고 이러는 것도 조금 뭔가 신기한 것 중에 하나인 거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좀 자극이 지루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막 정보가 빠르게 지나가니까 이거를 시간을 들여서 내용을 따라가고 감상을 하기를 좀 방해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하늬님)작업에 스크립트가 있었나요?
Hyelim: One thing I found kind of odd is how we can sit for so long and talk while looking at a static image or a calm installation piece made to let you rest, but when it comes to video—despite the visual stimulation and narrative—people often find it boring and don’t really watch. That’s a bit strange, isn’t it? I guess the stimulation itself can become tiring. There’s so much fast information that it actually interferes with spending time to follow the content and reflect on it. (To Hani) Did your work have a script?
하늬> 스토리보드가 있었어요. 저도 약간 대강의 글을 먼저 썼고요. 근데 그 작업에 들어가는 글이 아니라 디스크립션 같은 걸 먼저 썼고 이미지 중심적인 작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뭐 저는 이제 팀을 꾸려서 같이 하는 데, 이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뭘 찍고 싶은지. 그게 보통 이제 영화에서는 매개체가 스크립트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지 중심적인 작업이다 보니까 스크립트를 쓰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돼서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장면들을 다 그려서 그게 이제 스크립트처럼 기능을 했죠.
Hani: I had a storyboard. I wrote a rough text first—not something to be used in the actual work but more like a description. Since it was a very image-centered piece and I worked with a team, I needed a way to communicate what I wanted to film. In cinema, a script serves that role, but for me, since the focus was on imagery, a written script didn’t really make sense. So I drew all the scenes as a storyboard, and that functioned as a kind of script.
혜림> 뭔가 작업에 담고 있는 얽혀있는 레이어도 많고 연구했던 지점들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흥미로운 부분도 계속 조사를 하면서 당연히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 어떤 걸 담고 싶었는지
Hyelim: Your work had a lot of conceptual layers and research points. I’m sure there were tons of interesting ideas that came up. Which of those were you hoping to include in the work?
하늬> 제라르 라는 사람이 언어를 어떻게 다루는지 언어라는 미디어를 어떻게 다루는지와 ai 이미지 제너레이터가 어떻게 픽셀들의 어떤 정보 값을 교환시키면서 비슷한 이미지의 체인을 생성하는지가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라르 루카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들리는 위협적인 의미를 가진 문장을 음소들의 위치를 바꿔서 새로운 의미를 가진 문장으로 탄생시키는 방식으로 그런 어떤 증상들에 대항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그때 그때의 ai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과 되게 비슷했어요. 그때라고 하면 이제 2023년인데 지금은 또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카메라가 매개하는 퍼포먼스라는 미디어 이 3개의 레이어를 교차점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싶었어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도 미디어라는 측면에서 좀 의미 생산보다는 그 언어라는 기표의 물질성 에 주목하는 사례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ai 이미지 제너레이터도 얘가 어떤 그 픽셀의 어떤 의미를 알아내는게 아니라 픽셀의 정보값으로 다루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휴먼인지 아닌지 인증하기 위해서 신호등을 고르시오. 근데 이제 ai가 그런 거는 못 하는 이유가 이제 그 그 픽셀의 정보값으로만 걔네들을 보니까 어떤 언어를 기표 차원에서 물질적으로 다루는 이 제라루 루카스라는 사람과 좀 비슷한 태도인 것 같았고. 그런 2가지 레이어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어쨌든 저는 미디어가 어떻게 내러티브를 생산하는지에 좀 관심이 있어서 제가 어떤 내러티브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미디어를 선택을 한다라기보다는 제가 선택한 카메라가 매개하는 퍼포먼스라는 미디어가 어떤 이미지랑 어떤 이야기들을 생산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 관심사와 이 2가지 layer가 교차점이 생기면서 얘네들을 작업으로 같이 풀어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Hani: Gérard Lucas’s way of handling language as a medium really intrigued me. He transformed threatening-sounding sentences into new, benign ones by rearranging the phonemes. It was like a symptom, a coping strategy. And I found that very similar to how AI image generators create image chains by exchanging pixel data rather than understanding meaning. Gérard didn’t care about the meaning of language; he focused on its material quality—on the signifier itself. That really resembled how AI works: it doesn’t understand the meaning of a traffic light, it just processes the pixel information. Like when an AI can’t identify traffic lights in CAPTCHA because it only sees data values, not meaning. So I wanted to work with those three layers: language, AI image generation, and performance mediated by the camera. I wasn’t interested in just using a medium to deliver a narrative—I was more interested in how a chosen medium can generate narratives on its own.
혜림> 그 이제 윤주한테 아까 얘기했던 뭔가 '정지돼 있는 이미지랑 무빙하는 내러티브' 이런 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윤주 작업에는 )스크립트 그러니까 스토리북이 있고 비디오가 있잖아요. 근데 딱 작업을 봤을 때 뭔가 좀 아이러니했던게 여기 그 옛날 모니터가 이렇게 쌓여있는데, 다 죄다 정지돼 있는 사진 이미지고 영상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사진을 모니터로 보여줬는데 보통은 원래 영상을 틀었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이제 사진만 놓고 봐서. 여기는(모니터는) 되게 정지돼 있는 이미지인데 오히려 그 스토리북에서 스토리를 읽으면서 되게 뭔가 이 이미지가 이미지들이 흘러가면서 여기서(머릿속에서) 비디오가 뭔가 재생되는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의도했던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Hyelim: I have a question for Yunju about your work, especially in relation to what we said earlier about still images vs. moving narratives. You had a scriptbook and a video, right? But what struck me was that your old monitors were all displaying still photo images—no actual video. Normally those monitors show videos, but this time they were all static. Meanwhile, while reading the storybook, I felt like the images in my mind started moving—like the video played inside my head. Was that intentional?
윤주> 일단 제가 겪었던 일들이 보통 이미지적으로 떠오르지 않고 딱 한순간 한 순간에 엄청 강렬했던 그 장면만 이렇게 갑자기 산발적으로 딱 떠오르거든요. 그냥 막 어떤 사람의 얼굴이 그냥 갑자기 딱 기억이 난다거나 어떤 장소에 뭐가 있었다. 약간 이 정도만 기억이 나고 오히려 뭔가 갑자기 그때 일들이 스토리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 이미지는 또 생각보다 되게 강렬한 거 빼고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저는 뭔가 어 뭔가 이랬었다 하면서 그 일들과 그냥 제 주변에 저랑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뭔가 나도 그랬던 것 같아' 하면서 스토리적으로 계속 이게 레이어가 막 쌓이고 오히려 이미지는 너무 미디어의 폭력 이미지 이런 게 막 주입이 되다 보니까 뭔가 어 그 정도 였나? 나도 약간 이 정도로 겪었나?. 그냥 이게 이미지 기억은 이렇게 좀 섞여 있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스토리적으로는 완벽히 내 것 같은데, 뭔가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 영상이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 더 추가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비디오로 촬영을 하게 되면 막 제가 뭘 하고 있다가 뭔가... 어떤 사람이 뭐 가다가 뭐 어디서 떨어졌다(관계 없는 다른 픽션을) 이런 걸 추가하게 되는 느낌이 좀 있어 가지고 오히려 그런 스토리로 쓰는 게 좀 더 제가 겪은 일에 대해서 잘 풀어낼 수 있는 느낌이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스토리는 내가 고유하게 소유할 수 있지만 이미지는 너무 좀 그렇지 못하다는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엄청 섞이는 것 같아요. 막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 상상하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전 어렸을 때 뭐 맥주를 3병 마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린아이가 맥주 3병을 마시면서 막 이미지로 구상하는 것처럼 그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제 일과 남의 일들이 엄청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Yunju: For me, the things I’ve experienced don’t really come back to me as full images. It’s more like sharp flashes—like a face, or a detail of a place. That’s all I remember. And those memories usually come back as narrative, not as vivid images. Other than very intense moments, I barely remember any visuals. And the imagery feels mixed—like it’s been overwritten by media. I’d talk to someone who went through something similar, and as we talk, the story builds up in layers. But when I try to make it into a video, it starts feeling like someone else’s story. Like I’m adding scenes that aren’t mine. So writing it as a storybook helps me express what I experienced more accurately. I feel like the story truly belongs to me, but the image doesn’t. My memories and others’ get all tangled up. Sometimes when someone tells me something, I start imagining it—like, “When I was little, I drank three beers,” and then you picture a child doing that. All those imagined visuals pile up and clash with my own memories.
혜윤> 공감되는 부분이, 이야기나 기억은 내가 가진, 내가 본 그대로가 뭔가 전사되는 그런 느낌인데 이걸 영상으로 하려고 하면 어디서 본 듯한 구도나 어디서 본 듯한 클리셰로 내가 뭔가 만들어낼 것 같은게 나도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뭔가 미디어 인지 체계와 작업적으로 조금 얘기를 하자면 나는 어쨌든 어릴 때부터 만화를 본 사람이고 게임은 사실 진짜 잘 못해서 그걸 잘 하진 않았어요. 지금은 게임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남이 게임하는 거를 보는 거.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에서 찾아보고. 그래서 어쨌든 게임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게임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현실을 한 번 더 고민하게 하고 그런 것 들인 것 같아요.
Hyeyun: I totally relate. Stories or memories feel like exact replicas of what I saw or experienced. But when I try to turn them into video, I end up recreating compositions or clichés I’ve seen elsewhere. From a cognitive/media perspective, I grew up on comics—not games, I was terrible at those—but now I enjoy watching people play games on YouTube. I like how games can make you reflect on reality in a different way.
혜림> 네 그 약간 사람마다 게임하는 방식도 차이가 나서 좀 재미있는 거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게임할 때 뭔가 캐릭터가 있으면 그 캐릭터를 뭔가 꾸미는 거에 보통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고 그 캐릭터가 사는 집, 집을 꾸미고 이 얘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뭔가 보호막을 이렇게 건설하는 거에만 치중 했지 거기서 시키는 미션을 하고 이런 건 진짜 거의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어렸을 때 어떤 게임을 진짜 오래 했는데 그거 할 때도 거기 무슨 퀘스트라고 미션이 있는데, 그걸 하려면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아이템을 모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진짜 거의 안 하고 머리 염색하러 다니고 약간 이런 류의 활동을 많이 했고, 그래서 심즈도 할 때 뭔가 거기서는 심들끼리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이런 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를 안 하고, 그런 건 진짜 일절 안 하고 건축, 심을 나랑 얼마나 닮게 꾸미느냐, 그거를 했단 말이에요.
Hyelim: It’s funny how everyone has such different styles of playing. When I played games, I’d spend all my time decorating my character or their home, building a protective space around them. I rarely did the missions or quests. I remember one game where I never did the main storyline—I’d just wander around dyeing my character’s hair. Even in Sims, people usually explore relationships between Sims, but I didn’t care about that. I only focused on building and customizing the Sim to look like me.
혜윤> 맞아요. 그리고 저는 모으는 거, 수집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수집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뭐 도감이나 퀘스트가 있다. 그럼 그거를 다 깨는 게 저는 목표에요. 예를 들면 제가 동물의 숲을 했었거든요. 지금 최근에 나온 모바일 버전도 했었는데 저는 가구를 다 모으지 않으면 성에 안차서 다 모아요. 근데 그걸 사용해서 꾸미진 않아요. 꾸미는 건 너무 귀찮아서 그걸 다 모으면 아 다 모았다. 근데 너무 웃긴 게 혜림 언니네 집을 가면 되게 깔끔하고 예쁘게 꾸며져 있고 언니의 감성이 들어가 있고 언니의 색깔이 느껴지고 저는 제 집에 가면 물건이 막 쌓여있고 정리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사 모은게 정리돼 있진 않아요. 전 장식을 안 좋아하거든요. 청소를 못하니까 장식은 하나도 없고 효율적인 물건만 이렇게. 이게 좀 게임하는 방식에서도 그런 게 드러나는 게 어쨌든...
Hyeyun: I’m the opposite—I love collecting things. If there’s a collection system, like a Pokédex or quest list, I want to complete everything. I played Animal Crossing, and I couldn’t rest until I had every piece of furniture. But then I wouldn’t even decorate my place with them—I’d just hoard them. If you came to my house in the game, it would just be cluttered. No decorations, just functional stuff. Meanwhile, your place, Hyelim, would be so tidy and filled with your aesthetic.
혜림> 다들 무슨 게임 했어요. 어렸을 때
Hyelim: What kind of games did you all play when you were younger?
주윤> 리그 오브 레전드
Juyoun: League of Legends.
혜림> 아 티모
Hyelim: Ah, Teemo.
혜윤> 언니는 그거 뭐였어. 포지셔닝
Hyeyun: What was your role again?
주윤> 나는 서포터나 아니면은 그 아래에서 혼자 원딜. 케이틀린 제일 좋아하고 아니면 징크스
Juyoun: I usually played support, or ADC (attack damage carry) in the bottom lane. My favorites were Caitlyn and Jinx.
혜윤> 둘은 롤 안 했어요?
Hyeyun: You two didn’t play LoL?
채빈> 저는 안 하고 못하거든요. 게임을 못해가지고 진짜 못한다. 아니면 오빠가 좋아하는거
Chaebin: I didn’t. I’m really bad at games. If I played, it was just whatever my brother liked.
혜림> 나는 티모 해가지고 버섯밭 일구는 게 제일 큰 낙 이었어
Hyelim: For me, my favorite part was planting mushrooms as Teemo. That was the best.
혜윤> 거기 그런 기능이 있어? 싸우는 게임 아니야?
Hyeyun: Wait, it has that kind of feature? Isn’t it a fighting game?
혜림> 응 그니까 숨겨놔 곳곳에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도망가다가 밟으면 그게 독이 퍼져서 죽는 거야.
Hyelim: Yeah, but if you hide mushrooms around the map, people step on them and the poison spreads and kills them as they run away.
혜윤> 아 부비트랩 같은 거구나
Hyeyun: Oh, like booby traps?
혜림> 그래서 이렇게 은신해가지고 있다가 버섯 이렇게 심고
Hyelim: Right, so I’d go into stealth and secretly plant mushrooms.
혜윤> 나는 이런 게임을 잘하지 못하는데 내가 손이 진짜 느려서 반응 속도 느리고. 근데 난 이런 게임을 분석하는 게 너무 재밌어 아 얘는 이런 도트형 데미지를 입히네 얘는 이거네 그래서 밸런스가 이렇게 되네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되네 아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게 좀 재밌어 스토리를 하는 것도 재밌고 아 게임에 이 4차원 벽을 이렇게 깼네.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 거기서 좀 내 뭔가 이게 새로운 시선이 열려
Hyeyun: I’m not good at these kinds of games. My reflexes are slow. But I really enjoy analyzing them—like how each character inflicts damage, how the balance works, the systems behind it. I find it fascinating. It really inspires me—like, “Wow, they broke the fourth wall in this game!” It opens up new ways of thinking for me.
채빈> 난 진짜 mmorpg 했던 거 같아. 거상. 아 그니까 상인이 되는데 되게 막 싸움도 해야 되고 그런 류의 게임이었고 근데 우리 오빠가 했던 게임 다 따라서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비노기를 진짜 오래 했는데 그거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자율도가 진짜 높아서 뭐 그냥 뭐 사냥을 할 수도 있고 뭐 퀘스트를 깰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광장 같은 데 모여서 사람들이랑 수다만 떨 수도 있고 이런 거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여서 그거를 진짜 진짜 진짜 오래 오래 했던 것 같아요.
Chaebin: I think I mostly played MMORPGs. I used to play Gersang—you become a merchant but also have to fight. I mostly played whatever my older brother played. Then I played Mabinogi for a really long time. That game had a lot of freedom—you could hunt, do quests, or just hang out in the square chatting with other players. You could do anything. I think I really played that for a long, long time.
혜윤> 거기서 사귀었다는 친구분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사람들이었나요?
Hyeyun: I’m curious—did you make friends through the game? Were they similar to you?
채빈> 예 다 오타쿠였구요. 아는 언니 최근에 결혼했고 몇 년 지기지? 되게 오래됐어 초등학교 한 6학년 막 중학교 1학년 막 이럴 때 만났으니까 연락을 자주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꾸준히 막 잘 지내시고 어쨌든
Chaebin: Yeah, we were all otakus. One of the girls I met online recently got married. We’ve known each other since I was in 6th grade or the start of middle school. We don’t talk all the time, but we still keep in touch.
혜림> 처음 게임할 때는 그 사람 얼굴 못 본 채로 하다가 그 캐릭터만 보다가 이제 현실에서 실제 인간을 봤을 때 뭔가 그런 느낌이 어땠어요.
Hyelim: So at first, you only saw their character in the game and not their real face. What was it like when you finally saw them in real life?
채빈> 아 근데 뭔가 다 자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아 뭔가 비슷하다 약간. 나는 어렸을 때 게임을 여자 캐릭터 안 했어. 난 남자 캐릭터만 키웠어 무조건 남자 캐릭터만 키워
Chaebin: I don’t know, there’s always something about them that feels similar to yourself. Like, “Ah, we’re alike.” When I was younger, I never used female avatars. I only ever created male characters.
혜윤> 약간 나 그거 저번에 이론수업에서 들었었는데, 그런 디지털 페미니즘 이런 거 공부하면 그런 인터넷 세상이 내가 처음으로 내 젠더를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중에 하나라고 나와요.
Hyeyun: I actually learned something about that in theory class. In digital feminism studies, the internet is often described as one of the first spaces where people can experiment with their gender identity
채빈> 처음에 여자 캐릭터를 키웠다가 그 뭐지 거기 결혼 시스템이 있는데, 그 결혼 반지에 무슨 효과가 있었나 막 그래 가지고 그 언니랑 결혼하자 이래서 내가 남자로 환생을 해서 결혼을 시켜가지고, 나는 이제 계속 남자 캐릭터로만 ...
Chaebin: Yeah, at first I played as a girl character, but then there was this marriage system in the game. The wedding ring had some kind of effect or bonus, so my friend and I were like, “Let’s get married!” So I reincarnated as a male character so we could marry. After that, I only ever played as male characters.
혜림> 그 내가 했던 게임에도 성전환을 하는 게 있었어. 근데 성전환은 20만전 이었나 비싸가지고 할려면 돈을 진짜 엄청 벌어야 돼. 그리고 저는 게임할 때 이 게임 내용이나 스토리 이런 것보다도 그 주변 배경 디자인에 되게 흥미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롤도 처음에는 그런 싸우고 전략을 짜고 이런 것보다도, '와 여기 강이 있어, 여기 막 걸어 다니면 물 자국이 나' 이렇게 하다가 맨날 죽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런게 이제 양자역학인가? 하여튼 이런 거 설명할 때 게임 배경을 예시로 해서 좀 많이 설명 하더라고요. 내 시선이 닿는 곳에만 어쨌든 분자가 이렇게 작용해서 여기는 존재하는 세상이고 시선이 닿지 않는 뒤에는 분자가 닿지 않아서(?) 없는 세상, 약간 컴퓨터 게임 세상 속처럼 그냥 까맣게 존재하는 세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Hyelim: The game I played also had gender switching, but it cost like 200,000 in-game coins—it was expensive. You had to grind forever to afford it. When I played games, I wasn’t really into the storylines or missions. I was more interested in the background design and visual worldbuilding. When I first played LoL, it wasn’t about fighting or strategy. I was like, “Whoa, there’s a river here! Look, when I walk in the water, it leaves footprints!” Then I’d get killed right away, of course. But it’s kind of like quantum mechanics, right? They use video game environments to explain those ideas a lot—like how only the parts of the world you’re looking at exist, and everything outside your view doesn’t. It’s like how computer games render the world: the unseen areas just stay black and undefined.
혜윤> 그래서 게임에서도 좀 뭔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세계관이라는 것도 있고 뭔가 구성을 할 때. 다들 게임을 열심히 하셨나 봐요.
Hyeyun: I think I’ve definitely been influenced by games too—especially in how I imagine worlds and structure things. It’s all about worldbuilding. You guys must’ve all been really into games.
하늬>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Hani: I seriously didn’t play anything.
주윤> 와 저는 20살 이후 넘어서는 게임을 계속 안 하고 약간 게임한 것도 사실 그거였어요. 밤을 새보고 싶어서. 저 잠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밤을 새보고 싶은데 그땐 커피라는 거를 마실 생각 자체를 못 했고 다들 밤새우는 사람들 보면 게임하다 밤을 새더라구요. 그래서 게임을 시작했던 거
Juyoun: I actually stopped gaming after I turned 20. And the reason I even started was kind of silly—I really wanted to experience staying up all night. I’ve always been someone who needs a lot of sleep, and I never thought about drinking coffee back then. But I noticed people stayed up all night playing games, so I tried it.
혜윤> 그래서 롤에 빠지셨나요? 밤은 새셨나요?
Hyeyun: So did you get into LoL? Did you manage to stay up all night?
주윤> 불과 약간 1~2시간 남겨놓고 결국엔 아 안 되겠다. 하면서 포기했는데 그 덕분에 약간 재미를 좀 많이 들려서 한동안 좀 열심히 하다가 사실 제가 게임 진짜 못하는데 그냥 막 하는 타입이어가지고. 롤 원딜 좋아하는 여유는 타격감 좋아서. 멀리서 안전하게 타격감 좋은 거 딱 그거였어가지고
Juyoun: I gave up like an hour or two before sunrise. I just couldn’t make it. But I got hooked. I’m honestly not good at games—I just kind of mash buttons. But I liked ADCs with satisfying impact and range. That was my thing.
혜윤> 저 A.I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여기 전시 코멘트 중의 하나가 ä다들 A.I 제너레레이트나 A.I를 활용한 작업이 많은 것 같다, 그런 데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써준 코멘트가 하나 있기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A.I는 저한테 좀 '도구'라서. 근데 저는 저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환경오염이나 자원을 사용하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경계하면서도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미디어나 기술 그러니까 미디어라기보단 기술이 한 번 쓰면 편해서 이걸 못 떼어 내잖아요. 포기하려면 힘드니까 그래서 조금 정치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거는 뭔가 국가에서나 세계적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한 번 쓰면 개인적인 그런 걸로 통제 할 수는 없고 뭔가 법적이나 아니면 규약 같은 걸로 좀 규제를 해야... 그렇지만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chat gpt가 정말 정말 정말 유용하잖아요. 이번에 또 많이 썼던 거는 어도비에서 만든 파이어플라인가 그거 ai 제너레이터 그런 건데 얘가 확실히 어도비라서 사진 데이터가 많은 건지 되게 실제적으로 애니메이션이나 뭔가 ai 이미지 같지 않게 좀 진짜 같이 만들어주더라구요. 그리고 저희 세대가 그런 것을 빨리 받아들인다고 느끼는게 저희 어머님은 아직도 그거 쓰기 좀 거북하다면서 안 쓰시거든요.
Hyeyun: I have a question about AI. One of the comments we got from the exhibition was that many of the works seemed to use AI generators or were influenced by AI, and I wanted to talk about that. How are you using AI? For me, AI is more like a tool. But like I said before, there are environmental and resource concerns, so I try to stay cautious. Once you start using a technology, it’s hard to stop—it’s convenient. So I think it’s something that should be regulated at the national or global level. It’s not really something individuals can control. But as an international student, ChatGPT is just… unbelievably helpful. One thing I used a lot recently was Adobe Firefly, the AI generator. Maybe because Adobe has access to a huge dataset of real photos, the output looked surprisingly real, not artificial. And I feel like our generation adapts to these tools quickly. For instance, my mom still feels uncomfortable using it.
주윤> 아 우리 엄마 챗GPT 진짜 많이 쓰는데. 우리 아빠는 유료 구독자야. 그냥 아주 간단한 것도 그냥 챗지피티. 왜냐면, 네이버 이런 데는 사실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오고 약간 헛된 정보들이 너무 많고, 길게 말하니까. (챗지피티는)바로 이거 뭐야? 바로 물어보면은 딱 답이 나오니까. 약간 부모님이 사용하기에 더 편한 포인트가 있어요.
Juyoun: My mom uses ChatGPT a lot. My dad even pays for a premium subscription. They use it for the simplest things. Like, if they search something on Naver, the answers are unreliable or too long. But ChatGPT gives you a straight answer right away. It’s just easier for them to use.
혜윤> 그러니까 확실히 저희 세대는 어릴 때부터 검색을 하니까 검색하는 스킬이 있잖아요. 근데 챗GPT는 그게 조금 덜 필요하니까.
Hyeyun: Right, we grew up searching stuff, so we’re used to that process. But with ChatGPT, you don’t even need that skill anymore.
주윤> 사실 저는 제 작업에서 A.I가 그렇게 관여한 부분은 없는데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코드 짤 때 걔한테 짜라고 시켜놓고 제가 검토하고 수정하고, 원하는 부분도 바꾸고, 틀린 거 있으면 혼내고.
Juyoun: Honestly, AI doesn’t play a big role in my work, but if I had to mention something—it helps me write code. I tell it what to do, then I review and revise it, change what I want, and correct mistakes. I scold it if it's wrong.
혜윤> 그리고 우리 세대 동시대성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Hyeyun: Do you all think about contemporaneity—about being part of this specific moment in time?
주윤>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어서... 사실은 약간 객관적으로 잘 보이지가 않는거...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대답을 할게요
Juyoun: Since I live in this time, I think I’m inevitably a part of it… but I don’t think I have a clear view of it objectively. I’ll need to think more before I answer that properly.
채빈> 제가 생각하는 거는 A.I가 진짜 편하고, 완전 신기술이잖아요. 뭔가 진짜 여지껏 없었던. 정말 어렸을 때 과학 포스터에서만 그렸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현실이 된 느낌 중에 하나 인데, 사실 제가 저 작업할 때 엄청 좀 죄책감에 시달렸었거든요. 왜냐면 딥페이크를 쓰는데 사실 딥페이크 범죄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아 나 이거 써도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양심의 약간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양가적인 감정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좀 근데 약간 내 맥락에서 써도 그러니까 안 쓰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약간 내 도덕적인 그거에서는 조금 내가 이걸 진짜 써도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쓰기는 했는데. 이게 좀 쓰는 사람 나름인 것 같아요. ai도 뭔가 좋게 쓰는 사람들은 정말 좋게 쓰는 것 같고, 안 좋게 쓰는 사람들은 결국엔 그냥 그런 용도로만 쓰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기술이라는 게 항상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어쨌든 편리성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원의 낭비라던지 장단점이 좀 확실한. 그리고 동시대성에 관해서는 어쨌든 이게 미디어 아트를 하면서 독특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신기술을 되게 빨리 써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니까 정보를 다른 뭐 인문을 배우는 사람들보다 그런 걸 봤을 때. 그리고 뭔가 저는 요새 젠지 세대라고 말을 하는데 오히려 신기술에 대해 흡수를 잘하는 건 전 밀레니얼이 좀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타자가 진짜 빠르거든요. 타자가 빠른데 그거를 보고 애들이 놀라는 거예요. 너 타자가 너무 빨라 이렇게 그래서 사실 한국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얘네 보면 다 이게 독수리 타자를 치거나 약간 저 한 700 800 나오거든요.
Chaebin: I think AI is incredibly convenient. It’s like one of those futuristic technologies we used to only imagine in science posters as kids, but now it’s real. When I made my work, I struggled with a lot of guilt. I used deepfake, and since deepfake crimes are so widespread, I wondered if it was really okay for me to use this. It was a moral dilemma. It’s not like I had to use it—I could have avoided it—but I kept questioning myself. Is it really okay to use this? I think it really depends on how the person uses the technology. Some use AI in really positive ways, and others just abuse it. Technology is always a double-edged sword. It brings convenience, but also resource waste. It has clear pros and cons. In terms of contemporaneity, I think media artists are often early adopters of new tech. Compared to people studying humanities, for instance, artists seem quicker to try out new things. And people call us Gen Z, but I actually think millennials are better at absorbing new tech. For example, I type really fast—like 700–800 characters per minute—and people are always amazed by that.
하늬> 그 젠지인데 뭐 그런 거 싫어하는 애들도 많잖아요. 막 자기는 뭐 A.I도 별로고 뭐 자기는 뭐 아날로그가 좋고 안 쓰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이런 거 보면 그냥 개인의 선택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Hani: But there are also Gen Z people who hate this stuff—who are like, “I don’t like AI, I prefer analog.” I think in the end, it really depends on the individual.
채빈> 네 타자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말 미디어 세대의 진짜 코어적인 특성이 생각났는데, 저는 그 타자를 안 치고서는 생각을 못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는 항상 글을 쓰는 게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글을 써야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을 전개하기 위해서 글을 써야 되고, 근데 글을 쓰기 위해서 키보드가 없으면은 글을 못 써요. 그래서 생각을 할 때 키보드가 없으면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Chaebin: Speaking of typing, I realized something really core about being from the media generation: I can’t think unless I type. Writing is a habit for me. I need to write in order to think. But I can’t write unless I have a keyboard. So when I’m thinking, if I don’t have a keyboard, it’s like I can’t even process my thoughts.
하늬> 저는 근데 이게 이게 약간 기술이라는 게 장단점이 있다고 얘기하셨지만, 그것도 진짜 맞는 말이고 근데 더 저한테 흥미로운 부분은 정말로 이런 특정한 미디어 이런 기술들이 이런 그 생각 방식, 태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거, 아예 새로운 양식을 생산하는 거. 그리고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음성 메시지를 진짜 싫어해요. 근데 독일에서는 진짜 많이 쓰잖아요. 저는 음성 메시지가 진짜 싫거든요. 왜냐면은 타자 그니까 이걸 치는 게 낫지 음성 메시지는 뭔가 어색하고 좀 비효율적이죠. 못 알아들을때는 많으면 3번씩 돌려 들어야 되고 막 그런데 이거를 편해하는 애들은 그냥 이게 편하니까 '말로 하는 게 더 편하지' 이러면서 막 그냥 길 가다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말하고. 진짜 집중력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독일에) 와서 그게 문화적 차이가 좀 충격 먹었던 것 중에 하나에요. 익숙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익숙했으면 그게 편했겠죠. 저한테는 진짜 익숙하지 않은 문화고 저에게는. 한글의 특성이 또 타자 치기가 좋은 그거니까
Hani: That’s interesting. We talked earlier about the pros and cons of technology—and I agree. But what’s even more fascinating to me is how specific media or technologies can shape the way we think and act. They create entirely new formats and modes of thought. For example, how we use certain tools. Personally, I hate voice messages. But in Germany, they use them all the time. I really don’t like them—they’re awkward and inefficient. Sometimes you have to listen to them three times to understand them. But for people who like them, it’s convenient. They just walk around talking into their phone. They’re incredibly focused. When I first moved here, that cultural difference really shocked me. I just wasn’t used to it. If I had grown up with it, maybe I’d find it convenient. But for me, it’s a completely unfamiliar culture. And Korean is great for typing too.
주윤> 근데 저는 손이 없으면 그 여기 아이폰에 마이크로 말하고 텍스트로 변환해서 써요.
Juyoun: If I don’t have my hands free, I use the mic on my iPhone to speak and convert it to text.
혜윤> 저도 이거 진짜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음성 메세지는 뭐 얘기하신 것처럼 이어폰이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Hyeyun: I use that a lot too—more than voice messages. Because sometimes you don’t have earphones with you.
혜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는 약간 세대 차이라는 것도 뭔가 년 단위로 좀 다른가 싶은 게 저는 타자치면서 생각하는게 힘들거든요...? 생각할 때, 생각 따라갈 때부터 손으로 쓰는게 필요해서... 약간 뭔가 '아 컴퓨터로 생각 못하겠다' 이런느낌인데...
Hyelim: For me, I’ve realized that I actually can’t think well when I’m typing. When I need to think deeply, I have to write by hand. It’s like, “I can’t process thoughts through a computer.”
하늬> 근데 이거 손으로 쓰면 너무 느리니까 생각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너무 못 따라가지 않아요?
Hani: But isn’t handwriting way too slow to keep up with your thinking?
혜림> 그러니까 이게 글씨가 이제 그만큼 속도에 적응이 돼 가지고. 이 생각 속도에 맞춰서 오히려 논리적으로 정리하면서...
Hyelim: That’s true, but my handwriting speed has adapted to my thinking pace. It actually helps me organize my thoughts logically.
혜윤> 저는 그게 있어요. 글로 쓰면서 제가 화살표 일로 그렸다가 일로 그렸다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Hyeyun: For me, writing by hand helps because I can draw arrows and move things around.
주윤> 저는 사실 글을 진짜 요즘 안 써요 일부러 안 쓰기 시작했어요. 일기를 쓰면 스스로 너무 감성 속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걸 발견하고 나서 이거 좀 멀어져야겠다 싶어서
Juyoun: These days, I try not to write by hand. I realized when I write in a journal, I get too emotional. So I started avoiding it.
혜윤> 중국인들도 아무래도 그게 힘든가 봐요. 타자를 치는 게 영어로 먼저 치고 다시 한자로 변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언어라는 거에 타자도 작용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독일어도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Hyeyun: For Chinese people, it must be hard to type because they have to type in pinyin and then convert it to characters. So typing really shapes language. It might be the same for German too.
혜림> 그 제 지인 분 중에 타자 치는게 조금 어려우신 분이 계신데, 다 음성 메시지나 전화로만 소통을 해야해서 처음에 진짜 난생 처음 음성 메세지를 보내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 5번 녹음했다. 이게 생각 정리가, 그니까 말하면서 이게 매끄럽게 듣는 사람 좋게 간결하게 하는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음... 음... 이렇게 되고
Hyelim: I know someone who struggles with typing. They only use voice messages or phone calls. When I sent my first voice message, I had to record it five times because it was so hard to organize my thoughts and speak smoothly and clearly.
혜윤> 저 어디 틱톡 영상 같은 걸 봤는데 음성 메시지의 단점 이거였는데. 남자친구 생일이어서 거기 답장을 음성 메시지를 보는데 '와 너무 축하해' 이렇게 했는데 녹음 실수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녹음해야 돼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연기를 하는 거죠. 너무 축하해 정말 대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Hyeyun: I saw this funny TikTok where someone tried to send a birthday voice message to their boyfriend. They made a mistake while recording and had to re-record it, trying to act excited all over again: “Wow, happy birthday! That’s amazing!” It was hilarious.
혜림> 아 그리고 아까 A.I 그 딥페이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을 해보면, 저도 작업에 딥페이크를 썼잖아요. 그래서 저도 할 때 진짜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이 기술을 성범죄에 쓰는데, 나는 내 얼굴을 그런 성범죄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는 거에 쓰니까. 남들은 다 이제 인터넷에 얼굴 올리지 마라 이러고 있는데 나 이거 괜찮은가 하면서. 그래서 좀 그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은 나라도 뭔가 양질의 것을 내놓아야겠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희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곳에 이용하다 보면 이용자가 달라질 수도 있다.
Hyelim: And about what we were saying earlier—on deepfake AI—I used deepfake in my work too. I felt a lot of guilt while making it. Because this is the same technology that gets used for sex crimes. I was using my own face, and people are out there saying, “Don’t upload your face online.” So I kept wondering, “Is it okay for me to use this?” But in the end, my conclusion was: at least I should try to create something of quality. Maybe that could dilute the harmful uses, even just a little. If more people use it for meaningful things, maybe it could change how it's perceived.
채빈> 그리고 근데 제가 이 작업을 했을 때 했던 받았던 피드백 중의 하나가 독일 애들이 되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이렇게 직접 딥페이크를 쓴 게 조금 놀랍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얘네는 되게 그런거에 정말 예민하니까.
Chaebin: One of the comments I got when I showed this work was from some German viewers—they were really shocked. They said it was surprising that I used deepfake directly on my face. I guess they’re very sensitive about that kind of thing here.
하늬> 얘네는 챗GPT에 얼굴 절대 넣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Hani: Yeah, they even say you should never upload your face into ChatGPT.
혜림> 사실 나는 기술 그 자체는 순수하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기술을 만들고 사용하는 인간이 문제잖아요. 근데 어쨌든 인간을 불신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걸 작업으로 쓸 때도 그 맥락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가 중요하지 뭔가 이게 갖고 오는 편리성 때문에 작업에 쓰고, 이거를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이러는거는 우리가 지양을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Hyelim: Personally, I believe that the technology itself is neutral/pure/fine. It’s the humans who develop and use it that are the problem. But of course, you can’t fully trust people. So even when I use it in my work, I think the important thing is how you contextualize it. If you’re using it just for convenience or because it’s easy, then that’s something we should avoid.
하늬> 근데 저는 기술이 순수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기술이 상용화되고 개발되는가는 굉장히 인간의 정치적인 문제로서 결정되기 때문에 과학 연구 주제 결정조차도 그냥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것을 지원하는 여러 기업들과 아니면 그 필드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과 이런 모든 커넥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기술의 존재 자체가 순수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걸 어떻게 쓰느냐가 사실은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어요. 그냥 이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는 이미 얘가 어떻게 쓰여질지를 미리 예지한 채로 태어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Hani: I actually don’t think technology is neutral/pure/fine.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is already a political process. Even the choice of what to research in science isn’t random—it depends on funding, institutional priorities, industry connections. So the very existence of a technology is never truly neutral. And if you think about it, how we use it may not even be the most important issue—because many of these technologies are created with a predetermined purpose already built in. They’re born with a kind of destiny.
혜윤> 저도 기술이 100%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 동시에 그래서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좀 더 인간들이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다룰 것인가.
Hyeyun: I agree. I don’t think technology is 100% neutral/pure/fine either. Which is exactly why we need to think deeply about how to handle it responsibly.
혜림> 그러니까 내가 기술이 순수하다고 한 거는 이 메카니즘 자체가 순수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거의 뒤에 있는 탄생하게 된 배경 이런 건 어쨌든 인간의 의도니까 그런 인간의 의도가 불순한 거고, 그리고 또 되게 진짜 엄청 역설이 많잖아요. 나쁜 의도로 태어난 기술이 다시 좋은 쪽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고, 또 그 반대도 있고. 그래서 그게 항상 아이러니 하면서도 어쨌든 인간은 나쁘다. 인간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Hyelim: What I meant by “neutral/pure/fine” is the mechanism itself. The technology’s structure. Of course, the motivations behind its creation are human and thus not neutral. And there are always contradictions. A technology created for bad purposes might later be used for good—and vice versa. That irony always exists. But in the end, I believe people aren’t pure. People can’t be trusted.
채빈> 그 뭐지 저 최근에 이론 수업에서 배운 건데 테크노 나투어라고. 어쨌든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무조건 기술의 필터를 씌워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하늘을 관측하는 거 뭐 망원경이라는 것도 그 기술의 필터가 있고 뭐를 확대해서 볼 때는 현미경이나 돋보기 이런 어떤 한 개별 막이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는 뭔가 기술과 자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뭔가 기술과 이렇게 떨어져서 구분하는게 아예 안 되는 거 같고, 이거를 어떻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몰고 가냐 약간 이게 좀 화두이지 않을까.
Chaebin: Oh, I just remembered something I learned in theory class recently. It’s called techno-nature. The idea is that we can never perceive nature without a technological filter. For example, to observe the sky, we use telescopes; to magnify something, we use microscopes or lenses. There’s always some interface involved. So in today’s world, drawing a line between “technology” and “nature” doesn’t really make sense anymore. The two can’t be separated. The real question is how to steer things in a better direction.
혜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작업에 참여하시고 난 후에 느끼신 것이 있으신지.
Hyeyun: Lastly, how did you feel after participating in this exhibition?
하늬>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은 사실 어쨌든 각자 도시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만날 기회가 되게 소중하잖아요. 거의 없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저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뭔가 다른 분이 이런 작업을 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돼서 좋고,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독일인데 독일이 워낙 크니까 각자 독일에 대한 생각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것도 뭔가 신기했어요.
Hani: I really loved it. It’s so rare for all of us to meet up like this, since we all live in different cities. It was such a valuable opportunity. It was great to see what kind of work everyone else is doing too. Even though we’re all in Germany, everyone has a different experience of this place. That was fascinating.
혜림> 맞아요. 예대인데도 다 예대 안에서 생활하는 것도 다르고 이러니까.
Hyelim: Yeah, even though we’re all in art schools, our day-to-day lives are totally different.
하늬> 저는 이제 최근에 많이 생각하는 게 콜렉티브를 만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니셔티브 하신 게 너무 멋지고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신 것 같아서. 그리고 거기에 같이 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구 너무 뿌듯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어요.
Hani: Recently, I’ve been thinking a lot about how important it is to form a collective. That’s why I really admire what you initiated here. It feels like it’s heading in such a good direction, and I’m really honored and grateful to be a part of it.
주윤> 학교 내에서는 약간 어디 전시를 하더라도 보통 학교가 서포트 해주는 시스템 내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외부 전시를 보통 영상을 보내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배운 것도 너무 많았고 그냥 이 모든 게 스트레스와 기분 좋음이 공존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Juyoun: All my previous exhibitions were supported by the school system—organized internally. For external exhibitions, I usually just sent my video and that was it. But this time, we had to prepare everything from scratch, and I learned so much. It was a mix of stress and happiness all at once. Personally, I really loved it.
혜림> 음 전시는 어렵다. 녹음기 배터리가 적대요 여러분. 그럼이만.
Hyelim: Exhibitions are hard... The recorder battery is running low, everyone. That’s it for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