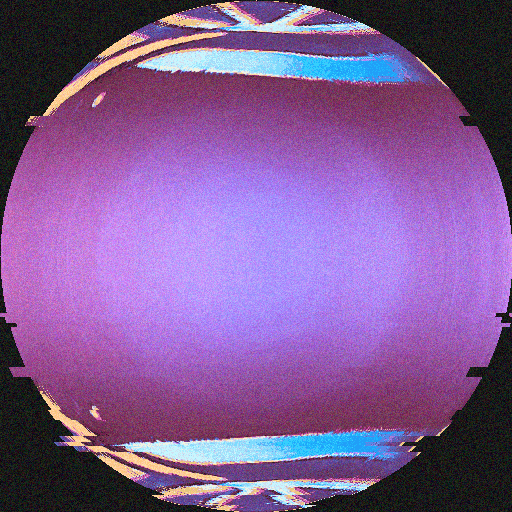Project Concept and Curatorial Essay
Hyelim Jeon, Project Director
1. To explore how media-based narratives have programmed us and reflect on contemporary cultural and cognitive systems.
Our project stems from the idea that media-driven narratives play a crucial role in reflecting contemporaneity. However, the term ‘media’ here does not refer to the material sense of the medium as a physical substrate, but rather to its broader and more comprehensive meaning - encompassing both analog and digital forms.
We have become accustomed to copying and documenting how subjects are represented within media, making them integral to media platforms. Consequently, we have reached a stage where we objectify and perceive ourselves in a similar manner, recording our own lives within media environments and positioning ourselves as the protagonists of these narratives. I define this phenomenon as a ‘media-based cognitive system’.
This narrative-focused, media-driven mode of thinking is particularly prominent among our generation in Korea. In the 1980s, Korea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oft power, subsequently developing cultural industries-including digital media-that significantly expanded the nation’s soft power.
As a result, narrative-driven films and dramas flourished, and we became increasingly capable of rapidly influencing and being influenced by online trends. Our generation, born after this critical moment, is the first to have lived entirely alongside advanced media technologies.
What kind of world are we living in?
Following the pandemic, our physical movements were restricted for a time, while online activity surged dramatically. People absorbed information and narratives at unprecedented speed, and cultural exchange occurred on a massive scale. Paradoxically, the world began to share the same trends. Even Germany, which had traditionally maintained a more conservative stance toward digitalization, has been steadily-and rapidly-embracing new technologies.
Throughout this process, individual experiences have influenced one another, transforming into original new, original narratives.
So, in what kind of world-and as what kind of selves-do we live today? Change can be disorienting, and we must seek to understand how it is reshaping us.
This project serves as an experiment in interpreting and expressing diverse media-based narratives through artistic practice. It aims to generate artistic discourse on contemporary social issues-such as the merging of the virtual and the real, the challenges arising from the uncontrolled proliferation of AI-generated works, and questions of authorship and copyright. Furthermore, it seeks to document, through artistic means, generational characteristics and contemporaneity, fostering both intergenerational and international exchange, and allowing audiences to directly experience the influence of ‘mediatic cognition systems’ on individuals and society.
By building online communities and networks, the project intends to ensure its sustainability and to create new discourse that encompasses artistic, social, and technological possibilities.
2. Main Research Focus : Narrative Media
1-1) 'Narrative Media' and 'Mediatic Cognitive System' : How has media programmed us, and in what ways has it shaped subjectivity?
How is the concept of a 'mediatic cognitive system' interpreted and reflected in each artist’s work? Our cognitive processes have been increasingly-and often subtly-shaped throughout our lives by the development of digital media, becoming deeply embedded in our individual experiences, whether positively or negatively.
This project examines and documents, from each artist’s personal perspective, how media-based cognitive systems have influenced their lives. The process evolved into artistic practice, with the exhibition exploring how each artist analyzes their individual mediatic cognitive system and translates it into visual form.
This project examines and documents, from each artist’s personal perspective, how media-based cognitive systems have influenced their lives. The process evolved into artistic practice, with the exhibition exploring how each artist analyzes their individual mediatic cognitive system and translates it into visual form.
1-2) Exploration of 'Media Narratives' and Artistic Diversity Across the Differing Media-Cultural Conditions of Korea and Germany : How media environments intersect with individual and artistic practices
Working abroad often brings paradoxical moments in which I come to understand more deeply the cultural contexts of Korean society and the cultural context in which I was raised. The works of Korean artists active both overseas and in Korea reveal certain common threads. Korea has cultivated a rich tradition of narrative-centered media, where everyday life and thought often intersect with mediated forms of expression. This has led to recurring linguistic and expressive tendencies that reflect shared media experiences, while still allowing for diverse individual interpretations. I aim to examine this not through the lens of cultural stereotypes, but in relation to the broader socio-historical processes that have shaped them.
Each culture has its own trajectory through evolving media landscapes. As noted earlier, in the 1980s, Korea embraced soft power and digitalization in parallel with rapid postwar economic growth.
Having previously endured thirty-five years of Japanese colonial rule(1910-1945)- a period in which the Korean language, name, and historical narratives were systematically suppressed- the country emerged from liberation with a powerful drive to restore its cultural identity. In the aftermath of the Korean War(1950-1953), national reconstruction became inseparable from the restoration of language, culture, and self-definition. The cultural discourse of the post-liberation era centered on reclaiming what was “ours,” rebuilding a sense of belonging and continuity that had been fractured under colonial rule, redefining national identity through language, art, and education.
Having previously endured thirty-five years of Japanese colonial rule(1910-1945)- a period in which the Korean language, name, and historical narratives were systematically suppressed- the country emerged from liberation with a powerful drive to restore its cultural identity. In the aftermath of the Korean War(1950-1953), national reconstruction became inseparable from the restoration of language, culture, and self-definition. The cultural discourse of the post-liberation era centered on reclaiming what was “ours,” rebuilding a sense of belonging and continuity that had been fractured under colonial rule, redefining national identity through language, art, and education.
At the same time, Japan’s rapid economic rise during the Korean War-fueled by the so-called ‘Korean War Boom(경기 특수,Tokushu Keiki, 特需 景氣)’-laid the foundation for its publishing, broadcasting, and animation industries (1. Johnson,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1982).
While Korea was rebuilding itself amid these changing regional conditions, it inevitably came into indirect contact with Japan’s industrial models and aesthetic frameworks. However, rather than merely absorbing these influences, Korean creators reinterpreted them within their own distinct media language (2: Kim, Media Consumption and Everyday Life in Asia, 2008).
While Korea was rebuilding itself amid these changing regional conditions, it inevitably came into indirect contact with Japan’s industrial models and aesthetic frameworks. However, rather than merely absorbing these influences, Korean creators reinterpreted them within their own distinct media language (2: Kim, Media Consumption and Everyday Life in Asia, 2008).
During the 1970s and 1980s, the import of Japanese popular culture was legally prohibited in South Korea-a national measure designed to reinforce cultural independence(3 :Iwabuchi, Recentering Globalization, 2002). Despite this, certain narrative and industrial structures of Japanese media continued to influence Korea indirectly, through transnational production models and informal circulation.
The gradual lifting of this ban under President Kim Dae-jung’s administration in 1998 marked the beginning of a new phase of cultural exchange, coinciding with the government's strategic use of culture as a vehicle of national branding and soft power. (4 : Jin, New Korean Wave, 2016).
In the 2000s, the so-called K-Wave emerged-a convergence of digital infrastructure, narrative-driven storytelling, and the hybridization of music, drama, and game industries. Korean media culture, while once shaped by external forces, began to extend outward as a creative power in its own right, striving not only for economic and aesthetic achievement but also for the articulation of its own cultural worldview.
By contrast, Germany has approached digitalization in a more a deliberate and ethically grounded manner, emphasizing privacy, transparency, and public accountability. (5: “Wer politisch arbeitet, braucht keinen Computer,” taz, 2018). In many academic contexts, active discussion continues around the ethical balance between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moral responsibility and values-particularly regarding the aggressive commercialization of AI. Topics include value of AI-generated works, data copyright, deepfake-related crimes, and the environmental implications of large-scale data storage.
From the standpoint of a Korean currently studying and working in Germany, I recognize how media cultures are interwoven with technological development through their own distinct historical trajectories. Therefore, rather than extending this research to a global level, I have chosen to focus on the contrasting media-cultural developments of Korea and Germany, which serve as a meaningful and focused framework for in-depth comparative inquiry into differences and affinities between the two media cultures. By situating these developments within their respective cultural contexts, this project seeks to explore how fundamental human values are transformed through such processes.
Our research scope is divided into three groups:
-Artists deeply engaged with German media culture
-Team MNE: artists deeply engaged with Korean media culture, currently studying in Germany, serving as intermediaries between the two contexts
-Artists deeply engaged with Korean media culture
-Artists deeply engaged with German media culture
-Team MNE: artists deeply engaged with Korean media culture, currently studying in Germany, serving as intermediaries between the two contexts
-Artists deeply engaged with Korean media culture
Positioned between these two poles, Team MNE functions as a bridge-fostering discourse by intersecting perspectives and contexts from multiple directions.
While this project takes Korea and Germany as its initial focal points, future research aims to expand toward a wider cross-cultural scope.
While this project takes Korea and Germany as its initial focal points, future research aims to expand toward a wider cross-cultural scope.
2) Context of the Exhibition Space and Experimental Exhibition Format : A simultaneous exhibition taking place in two cities (Leipzig-Seoul), connected through a 24-hour online live-streaming format.
The second major research focus lies in experimenting with modes of installation and the spatial configuration of the work. Through research framed as ‘spatial exploration’ with specific narrative contexts, we investigate installation approaches that respond to the historical and regional specificities of a site, along with the artistic possibilities emerging from them.
In our project’s first exhibition in June.2025, we explored site-specific installation, by reinterpreting an old cinema in Leipzig-its past and present role within the city-transforming it into an exhibition space seen through the lens of ‘explorers.’
Building on this foundation, our second exhibition in January.2026, experimented with an exhibition format connecting the time and space of Seoul and Leipzig through online live streaming.
In our project’s first exhibition in June.2025, we explored site-specific installation, by reinterpreting an old cinema in Leipzig-its past and present role within the city-transforming it into an exhibition space seen through the lens of ‘explorers.’
Building on this foundation, our second exhibition in January.2026, experimented with an exhibition format connecting the time and space of Seoul and Leipzig through online live streaming.
Exhibition Format :
In both the Seoul and Leipzig venues, diverse and experimental works utilizing this dual exhibition format was presented. Each space streamed its exhibition live to the other in real time: the live feed from Seoul was projected onto a wall in Leipzig, and vice versa. Although physically separated, the two venues were visually connected, creating the sense of a shared, unified space. Each venue thus served not only as a physical site for installation, but also as a ‘transmission station’ that virtually links the two.
In both the Seoul and Leipzig venues, diverse and experimental works utilizing this dual exhibition format was presented. Each space streamed its exhibition live to the other in real time: the live feed from Seoul was projected onto a wall in Leipzig, and vice versa. Although physically separated, the two venues were visually connected, creating the sense of a shared, unified space. Each venue thus served not only as a physical site for installation, but also as a ‘transmission station’ that virtually links the two.
Within this expanded mixed-reality setting, viewers were able to navigate between both spaces in real time, interact with them, or experience all the works from either locations. A camera installed on a track continuously streamed the exhibition 24 hours a day. The physical venues remained closed to the public while being virtually accessible, revealing a non-interactive space in which no visitors are present and only the works remain illuminated. This setup dissolved physical separation while exposing, in raw form, the contingencies, interactions, and sensory collisions that occurred within it.
Viewers also had the ability to rewind the live stream to revisit past moments, expanding the simultaneity of live broadcasting into the asynchronicity characteristic of new media. This ‘making the invisible visible’ further destabilized the boundaries of time and space.
Preliminary Experiment for the Exhibition Format :
In this exhibition format, both the physical and virtual dimensions function as essential components. All online content is transmitted from a physical space, and the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of that space shape the content itself. Alongside the exhibition format, careful attention must be given to types of works that, when presented within this system, can generate new forms of synergy. Participating artists therefore closely examine how their works function and are perceived within the physical environment. The tim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ities was also a crucial factor to consider.
An inter-university program between the two cities, held from September to December 2025, served as a preliminary stage to experiment with installation and streaming methods, spatial interaction, and to identify potential technical challenges in advance.
In this exhibition format, both the physical and virtual dimensions function as essential components. All online content is transmitted from a physical space, and the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of that space shape the content itself. Alongside the exhibition format, careful attention must be given to types of works that, when presented within this system, can generate new forms of synergy. Participating artists therefore closely examine how their works function and are perceived within the physical environment. The tim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ities was also a crucial factor to consider.
An inter-university program between the two cities, held from September to December 2025, served as a preliminary stage to experiment with installation and streaming methods, spatial interaction, and to identify potential technical challenges in advance.
>>References
1. Chalmers Johnson,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1. Chalmers Johnson,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2. Youna Kim, Media Consumption and Everyday Life in Asia (London: Routledge, 2008)
3. Koichi Iwabuchi, Recentering Globalization: Popular Culture and Japanese Transnationalism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2).
4. Dal Yong Jin, New Korean Wave: Transnational Cultural Power in the Age of Social Media (Urbana,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16).
5. “Wer politisch arbeitet, braucht keinen Computer.” taz – die tageszeitung, September 15, 2018. Accessed November 4, 2025. https://taz.de/Wer-politisch-arbeitet-braucht-keinen-Computer/!1817466/.
1. 프로젝트 컨셉 및 기획 의도
(Project Concept and Curatorial Essay – Hyelim Jeon)
미디어 기반 내러티브가 우리를 어떻게 프로그래밍해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동시대의 문화적·인지적 체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탐구한다.
우리 프로젝트는 미디어가 주도하는 내러티브가 동시대성을 반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말하는 ‘미디어’는 물질적 의미의 메디움(medium), 즉 특정 재료나 물성을 가진 매체로 한정되지 않는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포괄하는, 보다 넓고 총체적인 의미의 미디어를 가리킨다.
우리는 미디어 속에서 대상이 재현되는 방식을 복제하고 기록하며, 그것을 다시 미디어 플랫폼 안에 등장시키는 방식에 익숙해져 왔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또한 미디어 속에서 재현되는 대상으로 사고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미디어 환경 속에 기록하며 그 내러티브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는 방식에 익숙해졌다. 나는 이러한 현상을 ‘미디어 기반 인지체계(media-based / mediatic cognitive system)’라고 정의한다.
이와 같은 서사 중심의 미디어적 사고방식은 특히 한국에서 자라난 우리 세대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지 방식이다. 1980년대 한국은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토대로 디지털 미디어를 포함한 문화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켰다. 서사 중심의 영화와 드라마가 크게 성장했고, 온라인 트렌드를 통해 서로에게 빠르게 영향을 주고받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 시기 이후 태어난 우리는 발전된 미디어 환경과 전 생애를 함께한 첫 세대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팬데믹 이후 우리의 물리적 움직임은 한동안 제약되었지만, 온라인 활동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사람들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정보와 서사를 흡수했고, 문화적 교류는 전 지구적 규모로 확대되었다. 역설적이게도 전 세계는 비슷한 트렌드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수렴해 갔다. 디지털화에 비교적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던 독일 또한 점진적이지만 빠른 속도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개인의 경험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서사로 재구성된다.
팬데믹 이후 우리의 물리적 움직임은 한동안 제약되었지만, 온라인 활동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사람들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정보와 서사를 흡수했고, 문화적 교류는 전 지구적 규모로 확대되었다. 역설적이게도 전 세계는 비슷한 트렌드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수렴해 갔다. 디지털화에 비교적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던 독일 또한 점진적이지만 빠른 속도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개인의 경험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서사로 재구성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세계 속에서, 어떤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가. 변화는 종종 혼란스럽게 다가오며,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식과 정체성, 감각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미디어 기반 내러티브를 예술적 실천을 통해 해석하고 표현해 보는 실험이다. 이를 통해 가상과 현실의 혼재, 통제되지 않은 AI 생성 작업의 범람, 저작권과 저자성의 문제 등 동시대 사회를 둘러싼 이슈들에 대해 예술적 담론을 형성하고자 한다. 나아가 세대적 특성과 동시대성을 예술적으로 기록하고, 세대 간·국가 간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미디어적 인지체계’가 개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객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예술적·사회적·기술적 가능성을 포괄하는 새로운 담론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중점 연구 – 내러티브 미디어
(Main Research Focus: Narrative Media)
1-1) 내러티브 미디어와 미디어적 인지체계
미디어는 우리를 어떻게 프로그래밍해왔으며, 개인의 주관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미디어적 인지체계라는 개념은 각 참여 작가의 작업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반영되는가?
우리의 인지 과정은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평생에 걸쳐 점점 더 미묘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아 왔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러한 영향은 각자의 경험 속에 깊이 스며들어 오늘날 우리의 사고와 감각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이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각 작가의 개인적 관점에서 미디어 기반 인지체계가 그들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해 왔는지를 탐구하고 기록한다.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예술적 실천으로 이어지며, 전시는 각 작가가 자신의 미디어적 인지체계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것을 어떤 시각적 형식으로 변환해내는지를 살펴보는 장이 된다.
1-2) 한국과 독일의 상이한 미디어-문화적 조건 속에서의 미디어 내러티브와 예술적 다양성 탐구
: 미디어 환경은 개인과 예술 실천에 어떻게 교차하는가?
해외에서 작업할 때, 역설적으로 나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맥락과 내가 자라온 환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순간들을 마주한다. 해외와 한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작가들의 작업에는 일정한 공통의 흐름이 감지된다. 한국은 오랫동안 서사 중심 미디어가 발달해 온 환경으로, 일상과 사고 방식이 미디어적 표현 양식과 밀접하게 교차한다. 그 결과 공유된 미디어 경험을 반영하는 언어적·표현적 경향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동시에 각 개인은 이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며 다양한 변주를 만들어낸다. 나는 이러한 특성을 단순히 문화적 고정관념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를 형성해온 보다 넓은 사회·역사적 과정과 연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각 문화는 고유한 미디어 환경과 기술 발전의 궤적을 지니며, 그 발전을 수용·조정하는 방식 또한 다르다. 앞서 언급했듯이, 1980년대 한국은 전후의 빠른 경제 성장과 더불어 소프트파워와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한국은 35년간의 일본 식민 지배(1910–1945)를 거치며 언어·이름·역사 서사가 체계적으로 억압당했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는 훼손된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강한 동력을 갖게 되었다. 한국전쟁(1950–1953) 이후 국가 재건은 언어와 문화, 그리고 자기 정의(self-definition)의 복원과 분리될 수 없는 과제가 되었고, 해방 이후의 문화 담론은 ‘우리의 것’을 회복하고 식민 시기에 단절된 소속감과 연속성을 다시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언어, 예술, 교육은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중요한 축이었다.
한국은 35년간의 일본 식민 지배(1910–1945)를 거치며 언어·이름·역사 서사가 체계적으로 억압당했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는 훼손된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강한 동력을 갖게 되었다. 한국전쟁(1950–1953) 이후 국가 재건은 언어와 문화, 그리고 자기 정의(self-definition)의 복원과 분리될 수 없는 과제가 되었고, 해방 이후의 문화 담론은 ‘우리의 것’을 회복하고 식민 시기에 단절된 소속감과 연속성을 다시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언어, 예술, 교육은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중요한 축이었다.
한편, 한국전쟁 시기 이른바 ‘한국전쟁 특수(Tokushu Keiki, 特需景氣)’라 불린 전쟁 특수 경기는 일본의 빠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출판·방송·애니메이션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¹ 한국이 이러한 지역적 변화 속에서 스스로를 재건하던 동안, 일본의 산업 모델과 미적 프레임워크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한국과 접촉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의 창작자들은 이를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고유의 미디어 언어 속에서 재해석해 나갔다.²
1970~80년대 한국은 일본 대중문화의 수입을 법적으로 금지했는데, 이는 문화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다.³ 그럼에도 일본 미디어의 서사 구조와 산업 시스템은 초국가적 제작 모델과 비공식 유통 경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8년, 이 금지 조치가 단계적으로 해제되면서 새로운 문화 교류의 국면이 열렸고, 이는 국가 브랜드 전략과 소프트파워 정책과 맞물려 전개되었다.⁴ 2000년대에는 디지털 인프라, 서사 중심 스토리텔링, 음악·드라마·게임 산업의 융합이 결합된 이른바 ‘K-웨이브’가 형성되었다. 외부 영향 속에서 형성되던 한국 미디어 문화는 점차 독자적인 창의력을 지닌 문화 생산자로서 자리를 굳혀 갔으며, 경제적·미학적 성취뿐 아니라 고유한 문화적 세계관을 구성하고자 했다.
반면 독일은 디지털화를 보다 신중하고 윤리 중심적으로 접근해 왔으며, 개인정보 보호, 투명성, 공공 책임을 중요하게 여긴다.⁵ 특히 급격한 AI 상용화와 관련하여, AI가 생성한 작업의 가치, 데이터 저작권, 딥페이크 범죄, 대규모 데이터 저장의 환경적 영향 등을 둘러싼 논의가 학계 곳곳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에서 공부하고 작업하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두 사회의 미디어 문화는 각자의 역사적 조건과 긴밀히 연결된 채 기술 발전과 얽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무작정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하기보다는, 한국과 독일이라는 두 상반된 미디어-문화적 발전 양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깊이 있는 비교 연구에 적합한 틀을 제공한다. 이 프로젝트는 두 문화가 지닌 역사·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러한 발전 양상을 위치시키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근본적 가치가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다음 세 그룹으로 나뉜다.
독일의 미디어 문화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작가들
한국의 미디어 문화에 뿌리를 두고 독일에서 유학 중이며, 두 환경을 매개하는 팀 MNE
한국의 미디어 문화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작가들
팀 MNE는 이 두 지점 사이에 위치한 가교로서,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오는 관점과 맥락을 교차시키며 담론을 형성하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한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시작하지만, 향후에는 보다 넓은 문화 간 연구로 확장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전시 공간의 맥락 및 실험적 전시 형식에 대한 연구
: 두 도시에서 동시 진행되는 24시간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전시
연구의 두 번째 축은 설치를 하나의 방법론이자 공간적 사고(spatial thinking)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전개된다. 우리는 특정한 내러티브를 지닌 공간을 ‘탐험’의 대상으로 삼으며, 한 장소에 축적된 역사적·지역적 특수성에 예술 작업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때 건축 구조뿐 아니라, 공간이 조용히 품고 있는 정서, 기억, 문화적 잔여물을 함께 고려하고, 그 층위 속에서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협력 장소인 IG Fortuna는 이러한 실험을 수행하기에 특별히 밀도 높은 현장성을 지닌다. 과거 Kino der Jugend로 불리던 이곳은 한때 라이프치히에서 가장 큰 영화관 중 하나였으며, 집단적 관람 경험이 도시의 리듬을 만들어 내던 장소였다. 관객 수가 줄어들고 건물이 방치되면서 1987년 이후 오랜 시간 유휴 상태에 놓였지만, 지난 7년 동안 라이프치히 동부 지역의 주민·문화 활동가·시민들로 이루어진 이니셔티브는 이 공간을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 긴급 보수와 내부 정리 작업을 지속해 왔다. 그들은 건물의 물리적 존재를 지키는 동시에, 이곳이 다시 참여적 문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오늘날 IG Fortuna는 매끈하게 정비된 화이트 큐브가 아니라, 야외 상영과 커뮤니티 기반 문화 활동, 보존과 재발명의 협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살아 있는 구조물로 존재한다.
2025년 6월에 진행된 첫 번째 전시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공간을 ‘탐험가(explorer)’의 시선으로 다시 진입해 보는 시도였다. 우리는 이 장소를 폐허이자 가능성으로 바라보며, 도시 속에서 영화관이 과거와 현재에 수행해 온 역할을 재해석하고, 그 자체를 장소 특정적 설치로 전환하여 관객이 파편화된 역사와 기억, 그리고 상상된 미래 사이를 스스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 기반 위에서 2026년 1월에 열리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전시는, 이 탐구를 물리적 거리 너머로 확장한다. 서울과 라이프치히 두 도시를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연결하는 이중 전시 형식을 통해, 서로 다른 시간성과 문화적 리듬을 지닌 두 도시가 하나의 경험적 장(field)으로 엮일 수 있는지를 실험한다. 이를 통해 물리적·비물리적 장소, 현지·원격 관객, 평행적 시간성이 서로 교차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 드라마투르기(spatial dramaturgy)를 제안하고자 한다.
Exhibition Format – 전시 형식
서울과 라이프치히 두 전시장에서는 이중 전시 형식을 활용한 실험적 작업들이 선보인다. 각 전시장은 자신의 전시를 실시간으로 상대 공간에 송출한다. 서울의 라이브 영상은 라이프치히 전시장 벽면에, 라이프치히의 라이브 영상은 서울 전시장 벽면에 투사된다. 두 공간은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시각적으로는 서로 연결된 하나의 확장된 공간처럼 경험된다. 이로써 각 전시장은 단순히 작업이 설치되는 물리적 장소를 넘어, 두 도시를 가상으로 연결하는 전송 스테이션(transmission station)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확장된 혼합 현실 환경 안에서 관람객은 두 공간 사이를 실시간으로 오가며 상호작용하거나, 어느 한쪽에서 모든 작업을 경험할 수 있다. 전시장에는 트랙을 따라 움직이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전시 기간 동안 24시간 내내 공간을 송출한다. 물리적 전시장은 관객에게 닫혀 있지만 온라인으로 개방되어, 관객이 없는 어두운 공간 속에서 작품만이 빛나는 비상호적(non-interactive) 상태를 그대로 드러낸다. 이 설정은 물리적 분리를 해체함과 동시에, 그 안에서 발생하는 우발성·상호작용·감각적 충돌을 가감 없이 노출한다.
관객은 스트리밍 화면을 과거로 되감아 이전의 순간을 다시 볼 수도 있다. 이는 생중계의 동시성을 뉴미디어 특유의 비동시성으로 확장시키며,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을 가시화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더욱 느슨하게 만든다.
Preliminary Experiment for the Exhibition Format 전시 형식 사전 실험
이 전시 형식 안에서 물리적 차원과 가상적 차원은 모두 핵심적인 구성 요소이다. 모든 온라인 콘텐츠는 물리적 장소에서 송출되며, 그 공간의 특성과 조건은 콘텐츠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어떤 작품들이 이 시스템 안에서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각 작업이 공간 안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인식되는지를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서울과 라이프치히 간의 시차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두 도시 간 대학 협력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설치 및 송출 방식, 공간적 상호작용, 기술적 문제 등을 사전에 실험하고 점검하는 예비 단계로 기능했다.
각주 /
Chalmers Johnson,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Youna Kim, Media Consumption and Everyday Life in Asia (London: Routledge, 2008).
Koichi Iwabuchi, Recentering Globalization: Popular Culture and Japanese Transnationalism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2).
Dal Yong Jin, New Korean Wave: Transnational Cultural Power in the Age of Social Media (Urbana,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16).
“Wer politisch arbeitet, braucht keinen Computer.” taz – die tageszeitung, September 15, 2018.
More About Us :
The Project Team “Media Narrative Explorers” has been selected for the new prize “Respectively HGB” of Hochschule für Grafik und Buchkunst Leipzig and together with the HGB Friends e.V.
With this new award, the HGB, together with the HGB Friends e.V., promotes artistic and creative projects that are dedicated to the topic of “Studying at the HGB” and focus on social 'togetherness'. All HGB students were eligible to participate. A total of €5,000 was awarded, €1,000 of whic is prize money, €4,000 are earmarked for the realisation of the project. “Beziehungsweise HGB” will be awarded annually from now on.
Members of the jury were: Marie-Charlotte Elsner, Carla Maruscha Fellenz and Diva Lindenberg (HGB Student Council), Prof. Torsten Hattenkerl (Prorector HGB) and Steffen Woyth (Board Member HGB Friends e.V.).
A project description and further information on the prize can be found in the press release.